빈집 관리 지자체 일임 구조
재정자립도별 대책 성과 극명
정부 범정부TF 결성했지만
소관 부처 분산돼 관리 효율성 낮아
13만가구가 넘는 빈집이 전국에 방치돼 있지만,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이른바 '각개전투식 대응'이 우리나라 빈집 대책의 현실이다. 빈집 관리가 지자체에 일임된 구조 탓에 재정 여건에 따라 빈집 대책이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 TF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도시와 농촌을 따로 관할하는 부처 체계는 그대로다. 예산은 난립하고 정책은 좀처럼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일관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각각 도심과 농어촌 빈집으로 나눠 관리한다.
대응 주체는 각 시군구청장이다. 지자체장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농촌은 1년마다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 부처가 각각 도시와 농촌, 어촌 빈집의 소관 부처이긴 하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공간·구역 단위 재생 사업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정도로 한정돼 있다.
빈집을 예방하거나 철거하는 등의 대응 전반이 지자체의 자치 사무로 전락하다 보니,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성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서 진행된 빈집 정비사업은 2865건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573건으로, 전국 빈집이 13만4009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농촌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예산 확보 난항
경기 연천군은 올해 빈집 정비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을 겨우 확보했다. 지난해(2억38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연천군은 경기도와 빈집 예산을 절반씩 매칭해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도의 지원이 지난해 89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줄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다. 결국 군은 추가 경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노력 끝에 확보한 예산이지만 빈집 철거 비용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연천군 내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8억9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군이 지난해 발표한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 군 내 철거가 필요한 특정 빈집은 61가구로 집계된다. 연천군은 2028년까지 총 6억1000만원을 들여 정비 계획을 세웠다. 이는 오로지 철거에만 소요되는 예산이다. 한 가구당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그런데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한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이 소요된다"며 "이에 더해 빈집 철거 시 각 가구당 설계비용이 약 100만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이 나은 수도권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억6500만원을 끝으로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이 끊겼다. 올해 철거 외 편성된 전체 빈집 예산은 18억4900만원으로 2021년(76억5400만원) 대비 75.8% 쪼그라들었다.
시는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빈집 필지 매입 사업을 위해 약 24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가 출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H는 현재 이 예산의 89.6%를 집행했으며 남은 예산(약 253억9900만원)과 빈집 관련 매각 수입(약 61억6900만원)을 더하면 총 가용 예산은 약 315억67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부처별 예산 편성 비용 차이…정확한 예산 액수 파악 어려워
지자체 주도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는 지난해 4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빈집 정비 TF'를 꾸렸다. 지난 1일에는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도 발표했다. 농림부·해수부·국토부는 각각 농어촌과 도시 빈집에 대해 국가·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별 소관 부처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3개 부처가 농촌과 어촌, 도시 빈집을 각각 관할하는 구조다 보니 부처별 빈집 예산이 난립하고 편성 액수마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농림부는 올해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과 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5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어 해당 예산 183억원 안에 빈집에 지출한 비용이 일부 포함된 상황이다.
국토부의 경우 빈집에 한정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생활환경 사업인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정비사업 일환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있어 구체적인 액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예산으로 100억원, 해양수산부는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출연 재원 5억원을 빈집 활용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를 포함한 4개 기관이 제각기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빈집 정비와 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가 예산 컨트롤타워 …매년 4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빈집별 소관 부처가 분산된 구조에서는 정책 혼선이 벌어지고 효율성은 떨어진다. 각 부처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구조에서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기 어렵다. 지자체로서도 매년 예산을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보수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빈집 활용과 철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총괄한다. 지자체가 정비와 활용 대책을 수립하면 정부는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5년간 빈집종합지원대책 명목으로 최소 45억엔(약 431억원) 이상을 예산으로 편성해 왔다. 2021년과 2022년에는 45억엔, 2023년에는 54억엔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59억엔이 편성되며 예산 규모가 대폭 늘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 지자체에 명확한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빈집 철거 또는 활용 시 시행 주체가 소유주인지, 지자체인지, 비영리기관인지 세분화해 지방비와 국비 보조 비율을 달리해 지원한다. 각 지자체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취한 조치다.
지금 뜨는 뉴스
전문가는 컨트롤타워 중심의 일원화되고 통합된 지원책이 마련될 때 빈집 대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현재는 지자체가 빈집 관리와 예산을 일임하는 형태다 보니 시범사업이 정식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재정문제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매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빈집 대책이 시범사업에 그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3만 빈집리포트]⑤도시 따로 농촌 따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2300222469945_1747927344.jpg)
![[13만 빈집리포트]⑤도시 따로 농촌 따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1916085663759_1747638537.jpg)
![[13만 빈집리포트]⑤도시 따로 농촌 따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1916061763747_1747638378.jpg)
![[13만 빈집리포트]⑤도시 따로 농촌 따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1916070963752_1747638429.jpg)
![[13만 빈집리포트]⑤도시 따로 농촌 따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1916072863753_1747638448.jpg)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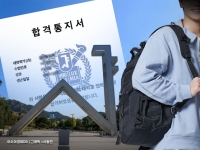
![[속보]NHK 출구조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90916295225964_1757402992.png)

![쿠팡 잡으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13년 만의 '변심'에 활짝 웃는 이곳[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42307522530624_174536234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