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신상정보 무분별 유출"vs"범죄자 처벌 제대로 했으면 만들어졌겠나"
전문가 "비판 방법, 수위 사회적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성범죄자로 추정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이트 존폐를 둘러싼 논란 재점화하고 있다.
범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개인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등으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일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익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교도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는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죄목으로 대학생 A씨(20)의 사진과 전화번호, 학교·학과 등을 공개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맞다. 다만 그 외 모든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A씨가 가해자임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들어 그의 신상을 계속 공개 상태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 타인 신상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개인이 단순 제보를 받아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인정한다면 국가는 무법지대로 변할 것"이라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법부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타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8월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동명이인의 정보를 공개했다가 삭제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무고한 피해자 발생, 극단적 선택 등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공익을 위해 디지털 교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그간 사법부가 성폭력 처벌에 있어서 충분히 단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행한 성범죄 관련 재판 7만4956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1만9567건(26.1%)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3만1006건(41.4%), 벌금형은 2만2669건(30.2%)으로 집계됐다.
또 앞서 사법부는 'n번방 사건'에 깊이 가담한 일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불가 결정을 내리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직장인 A(28)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많으니까 이런 사이트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배려받고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한다고 한다. 애초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당한 행위가 아니며,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사법부 처벌이 미약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비판은 아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나 확실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 사법권이 발동할 때도 법에 근거해서 고심 끝에 판결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인이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합당하지 않다"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의 목적과 취지는 알겠으나, 신상이 공개된 사람 중에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런 사적 보복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비판의 방법이나 정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담론하고 이를 법과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법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 뜨는 뉴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디지털 교도소가 만들어진 이유는 주로 피해에 노출되는 계층에서 처벌이 미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성범죄에 비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약하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 범죄라는 경각심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학교, 회사 등에서의 성범죄 예방 교육,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과 처벌에 대한 수위가 함께 상승할 때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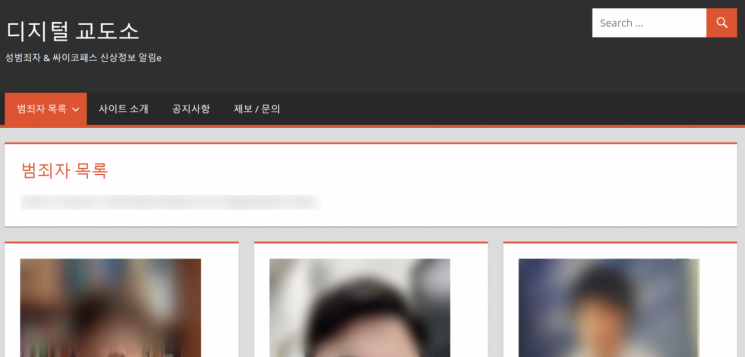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일주일 만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껑충'…머스크 언급에 기대감 커진 한화솔루션[이주의 관.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09215637724_1770769315.jpg)



![[클릭 e종목]](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07442337310_1770763462.jpg)

![[뉴욕증시]美 소매판매 3년 만에 최저…경기 약화 우려에 증시 하락 마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09251737735_177076951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