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엠바고가 걸렸던 경향신문과 세계일보가 15일자 종이신문 1면 기사내용을 공개하면서, 엠바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페인어 ‘embargar’에서 유래된 엠바고(embargo)는 보도유예를 뜻한다. 본래 선박의 억류나 출항금지를 의미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일정시점까지 뉴스 보도를 늦추는 뜻으로 쓰인다.
‘비보도’인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와는 구별된다. 엠바고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기자들에게는 불문율로 통한다. 엠바고를 준수하지 않는 기자나 언론사는 이후 취재 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자와 언론사들은 엠바고를 지키는 게 보통이다.
엠바고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언론계 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상륙일시와 지점을 미리 브리핑했다. 누군가 특종 욕심에 미리 보도했더라면 사상자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엠바고의 목적은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국가안전·공익용 엠바고(인명 보호 등), 보충취재용 엠바고(전문성 높은 뉴스), 조건부 엠바고(사건 발생 이후 보도), 관례적 엠바고(협정·회담 등), 발표자료 엠바고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엠바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전까진 ‘확정될때까지’ 등의 단서로 언론에 보도 유예를 주문했다.
한편 과도한 엠바고 규제로 빈축을 산 경우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엠바고 파기시 모든 부처의 인터뷰 거부 등을 추진하다 과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아덴만 작전의 엠바고를 깬 일부 언론사에 대해 청와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 논란을 빚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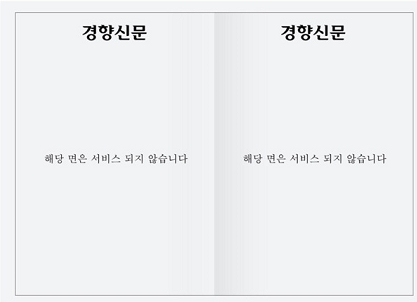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현대차 美 40년 질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612350031914_17703489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