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의 뿌리, '산업단지 50년'을 돌아보다 <3>
제조업 중심서 탈피…생산서 기술로 패러다임 전환해 개도국 추격 따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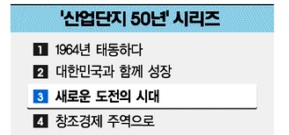 .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991년 3월 16일 오후, 여느 때처럼 물을 받으려 수도꼭지를 돌린 대구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나는 악취에 코를 감싸쥐었다. 악취를 유발한 물질은 클로로페놀로 페놀과 상수도 소독제인 염소가 결합한 물질이다. 페놀은 인근 구미공단의 한 전자업체가 흘려보낸 것이었다. 녹색연합이 지난 1999년 '우리나라 환경 10대 사건'을 발표하면서 1위로 꼽은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다.
◆생산에서 기술로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거치며 빠르게 발전해온 우리 산업에 1990년대부터 '쉼표'가 찍히기 시작했다. 산업단지는 '산업의 터전'에서 '오염 배출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시작했다. 페놀 오염 사건에 앞서 1985년 발발한 '온산병 사태'도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했다. 앞만 보며 달리는 데 치중하는 사이, 산업발전의 또 다른 측면인 환경오염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는 산업단지에 있어 '도전의 시대' 였다. 환경오염은 줄이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높아진 국가적 위상 역시 우리 산업단지의 변신을 요구했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과 성실함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대표적이다. 1964년 조성된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산업화를 이끈 구로공단은 이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화(空同化)가 일어났다. 임금과 생산비가 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월ㆍ시화공단 역시 1980년대 후반 노사분규로 진통을 겪고, 1990년대에는 중국에 입주기업을 뺏겼다.
정부는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지식수준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전국에 과학산업연구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생산'에 있었던 산업의 무게중심을 '기술'로 변화시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광주첨단단지를 기획하고, 1990년대 들어 부산ㆍ대전ㆍ대구ㆍ전주ㆍ강릉ㆍ오창 등 여섯 곳에 지방과학산업단지를 세웠다.
◆산단, 창조경제를 만나다 = 1990년대 중반부터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의 이미지로 갈아입었다.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통용되던 '공업단지'라는 용어는 '산업단지'로 대체됐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이 설립된 것도 이 때다. 구로와 부평, 주안을 관리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과 구미를 관리하는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창원과 울산이 속한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반월과 시화ㆍ아산을 통괄하는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여수와 광주ㆍ군산을 관리하는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전국에 있는 다섯 개의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합쳐서 1997년 1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립됐다.
최근 '창조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조명받는 벤처기업들도 이 때 처음 등장했다. 1997년 여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처에 벤처타운과 벤처빌딩이 급속히 늘어났다. 벤처단지, 지방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도 등장했다. 테크노파크와 미디어단지,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와 임대전용단지도 생겼다. 공장 굴뚝이 들어찼던 '공단'은 점점 벤처기업이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이 빼곡이 세워진 '산단'으로 바뀌어 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속보]'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무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911364534184_177060460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