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비> 11회 KBS2 월-화 밤 9시 5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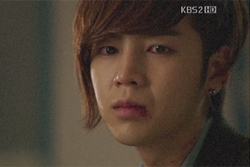
사랑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아무리 뜨거웠던 감정이라 해도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언젠가는 무덤덤한 일상의 일부가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 <사랑비>는 이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진 사랑의 운명을, 변치 않는 첫사랑의 신화로 거스르려 한다. 그것도 단 3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시간의 역설을 통해. 32년 전 윤희(윤아)가 인하(장근석)를 떠날 때 그에게 받은 시계를 돌려준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닌 일시적 단절을 의미하며, 윤희(이미숙)와 재회한 인하(정진영)의 고백은 그것을 증명한다. “내 시간은 우리가 걸었던 바닷가 그 어딘가에 쭉 멈춰져 있었어요.” 한 여자와 오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별명이 한 달 반”이라는 서준(장근석)의 인스턴트 연애관도 이 사랑의 신화를 강조하려는 한낱 설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잔인한 시간의 힘을 정지시키려는 <사랑비>의 의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의 로맨스가 현실감 없는 무중력의 판타지로 다가오게 하는 주원인이 된다. “처음 만난 날부터 내 풍경은 쭉 당신이었”다는 인하의 고백처럼 이들의 사랑은 그저 화폭에 고정된 예쁜 정물화 같다. 인하의 캔버스와 서준의 카메라는 사랑의 가변성을 영원에 붙드는 상징적 매개체지만, 동시에 의도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 생기를 잃어버린 <사랑비> 로맨스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제 준이 아버지의 첫사랑이 하나(윤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던 끝에 이별을 고하는 극적인 순간에도 그 애절함에 몰입이 되기보다 풍경을 감상하듯 거리를 두게 된다. 신화적 멜로에 대한 강박은 시청자들의 시간 역시 자꾸만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10 아시아>와 사전협의 없이 본 기사의 무단 인용이나 도용,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0 아시아 글. 김선영(TV평론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속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911364534184_177060460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