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주대회’가 1980년 이후 45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 산주대회는 그간 변화된 산림 패러다임을 산주들에게 설명하고, 산림경영에서 산주의 직·간접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산주대회를 개최했다. 산주대회는 전국 산주가 모여 산림경영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4000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렸다. 앞서 산림청이 진행한 사전 참가 신청에는 산주 3659명이 참여해 산림경영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업직불제 등 산림경영 지원제도와 임산물·목재생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현장에서는 숲과 임업을 결합한 복합경영, 숲을 활용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 경영 체험림, 조경수 재배 분야에서 성과를 낸 임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참자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큰 틀에서 산림정책은 1970년·1980년대 국토녹화에서 1990년대 이후 자원순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가령 1972년 ‘제1차 치산녹화 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면적 667만㏊ 중 83만㏊(12.5%)에 나무가 없었고, 임목축적도 10.6㎥/㏊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해 과거 산주대회는 ‘국토녹화’에 초점을 맞춰 열렸다. 산주의 동참을 이끌어 국토녹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가 다분히 반영된 자리였다.
하지만 국토녹화에 성공한 이후 우리나라의 산림 임목축적은 172.4㎥/㏊(1972년 대비 15.6배)로 늘었고, 목재 자급률도 2023년 기준 17.4%로 높아졌다. 국토녹화에서 산림의 자원화로 산림정책이 전환된 배경이다.
산림의 가치도 커졌다. 산림에서 단순히 임산물과 목재 등을 생산하는 데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탄소흡수저장·대기정화·수원 함양 등 무형의 공익적 가치(연간 259조원 추산)에 무게 추가 더해진 것이다.
다만 사유림의 소유 구조가 파편화되고, 산주의 거주지와 산림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부재산주가 소재산주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사유림 경영 여건은 되레 악화된 형편이다.
실례로 사유림 필지 수는 2005년 384만개에서 2023년 492만개로 증가(파편화)했고, 같은 기간 산림 3㏊ 미만을 소유한 산주 비중은 83.1%에서 88.6%로 높아졌다. 이는 고령 산주가 자녀에게 사유림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필지가 쪼개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수록 산림(사유림)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림의 파편화 과정(소유주 분산)이 산림의 경제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 산주가 과거처럼 산림경영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방치되는 산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산림청이 올해 산주대회를 45년 만에 부활시킨 배경도 이와 맞물려 설명된다. 과거 산주들의 동참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되살려, 산주대회가 산주의 산림경영 동참을 유도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산림청의 복안이다.
지금 뜨는 뉴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대회가 산주 중심의 산림경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220만 산주의 권익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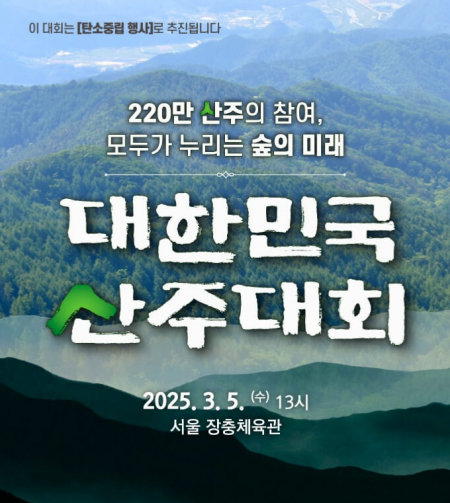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주末머니] 줄어든 M7 영향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4040117263825128_171195999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