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이장이 다녀가고 난 다음 날 아침, 하림은 짐을 챙겨서 총총히 그곳을 떠나왔다. 갈 때나 올 때나 먹을거리 담겼던 라면 박스만 빼고 나면 짐도 똑 같았고, 사람도 똑 같았다. 다만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을 뿐이다. 더러 잔설이 남아 있던 산등성이엔 언제 그랬냐는 듯 여름의 푸른 기운이 가득했다. 털털거리는 낡은 아빤떼는 곧 저수지가 있는 골짜기를 빠져나와 처음 하소연이를 만났던 긴 비포장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아쉬울 것도 미련 둘 것도 없었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한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번 지나간 강물에 다시 발을 담그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시간은 오로지 앞으로, 앞으로만 흐를 뿐이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현재라고 부르고, 지나간 것을 우리는 과거라고 부른다. 과거는 망각과 추억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그림자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생에 완성이란 없다. 미완성이면 미완성인 대로 그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뿐이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듯이 차에서 내리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게 인생인지 모른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이 많은 인연들과 만난다. 때로는 사랑하는 인연으로, 때로는 미워하는 인연으로.... 때로는 선연(善緣)으로 때로는 악연(惡緣)으로.... 그런 인연들이 모여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 흘러가는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하림은 다시 바빠졌다. 버스를 타다 지하철로 갈아 탄 것처럼 느린 주파수에서 빠른 주파수로 금세 옮겨졌던 것이다. 언제 살구골이었냐 싶게 서울은 모든 것이 빨랐다. 차도 빠르고, 사람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뉴스도 빨랐다. 도무지 기다리는 데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처럼 느껴졌다.
배문자부터 찾았다. 그녀에게서 받은 숙제부터 처리해야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응....? 다 됐어?”
6개월만이었다. 을지로 5가 중국집 이층에 자리잡은 출판사는 여전했고, 그 사이 결혼을 한 그녀 역시 겉보기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다만 왼쪽 약지에 결혼반지인 듯한 가락지가 하나 걸려있는 게 다를 뿐이었다. 하긴 결혼을 하나 하지 않으나 그게 그거일 터였지만....
“재미있어?”
대답 대신 하림이 말했다. 자기도 모르게 어색한 미소가 흘러나왔다. 머저리 같이 생긴 꽁지머리 만화가 오현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응. 재미있다!”
하림의 장난스런 어색한 물음에 그녀는 ‘그래 됐냐.’ 라는 식으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녀다운 태도였다. 차라리 그게 속이 시원했다. 한때 연인이었던 그들 사이가 그녀의 그런 대답으로 금세 농담처럼 편해졌다. 그리고보면 인생이란 다 그런거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이 바라보며 웃었다.
“어때? 작품 나올 것 같애?”
“몰러. 오현세 씨 하기 다름이겠지.”
“지랄...”
하림이 가방에서 대본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배문자는 굵은 검은 태 안경을 고쳐 쓰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대본을 살펴볼 동안 하림은 눈을 들어 사무실 여기저기를 구경삼아 기웃거렸다. 여전히 산더미 같이 쌓인 책더미 사이 사이에 풀벌레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편집부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수지와 화실이 있던 살구골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글. 김영현 / 그림. 박건웅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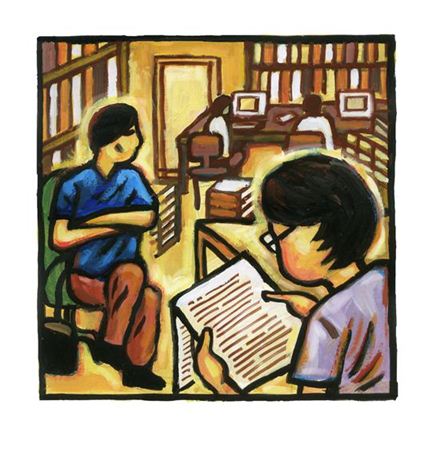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