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글쓰기의 어려움
아이디어·문장·구성·실력 등
4가지 요인에 영향 받아
감식안 가지되 완벽주의 경계
포기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
편집자로 일하면서 숱한 작가들을 만났다.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스스로 힘을 불어넣으면서 꾸준히 작품을 써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작가들 대부분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슬럼프에 빠져서 긴 휴지기를 보내곤 한다. 한 해 수십 명이 문예지나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가가 되지만, 10년 후에도 여전히 청탁받고 책을 내는 이는 대여섯 명에 지나지 않는다. 꾸준히 글을 쓰기란 그만큼 더디고 외롭고 힘겨운 일이다.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곤 하는 대만 작가 천쉐는 자전적 에세이 ‘오직 쓰기 위하여’(글항아리)에서 "부지런한 작가이자 유능한 글쓰기 노동자"가 되려고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준다. 데뷔하고 10년 동안 천쉐는 먹고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일감을 받아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닥치는 대로 해내는 한편,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해 오락이나 사교 활동을 모두 포기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냈다.
오직 책 읽고 글 쓰는 데만 몰두하는 루틴을 만들고, 반복 훈련을 통해 인생을 거기에 맞추는 자기 절제 없이 끝까지 작가로 남기란 불가능하다. 살아남는 작가들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글을 쓴다. 하루 일정 시간 어김없이 글을 쓰면서 의자와 한 몸이 되는 고도의 자기 수련만이 인간을 작가로 변화시킨다.
문제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저절로 작품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적당한 글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텅 빈 화면을 눈앞에 두고 끙끙 앓으면서 지내다 보면 내 안엔 시시한 생각, 어디선가 본 듯한 진부한 발상밖에 없구나, 싶어 좌절하는 일이 더 흔하다. 어쩌다가 괜찮은 생각이 떠올라도 끝까지 글을 이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다. 대부분 몇 줄 써놓고, 끼적이다 지쳐서 그만두곤 한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정제 안 된 글들이 넘쳐나지만, 직업적으로 좋은 글을 써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발표하는 글보다 버리는 글이 더 많다. 하루 종일 쓰다 지우다가 몇 줄도 못 채우고 폐기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작가들 컴퓨터 한구석엔 대개 ‘쓰다 만 글’을 모은 곳이 있다. ‘쓰는 생각 사는 핑계’(민음사)에서 이소호 시인은 어떤 작품을 끝맺지 못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글은 좀처럼 마무리 짓기 어렵다.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중요하다. 독자들 흥미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사유보다 아이디어 쪽에 지나치게 기대다 보면, 어느 순간 글 전체를 포기"하기 쉽다. 아무리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도, 쓰는 사람의 사유와 단단히 결합하지 못하면, 발표할 만한 글이 되긴 힘들다. 문학에선 특히 그렇다. 누구나 관심 두고 이해할 만한 보편적 생각보다 작가의 고유한 감각과 사유가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게 없을 때, 작품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다.
둘째, 쓰던 글에서 단 한 문장만 괜찮을 때, 작품은 완결되지 못한다. 문득 떠오른 단 한 문장에 꽂혀서 작품을 이리저리 매만지다가 실패하는 경우다. 이럴 때 작가는 외과 의사처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문장" "내 마음을 대변한 문장"이 "내가 더럽게 못 쓴 작품 안에서 죽어 가"지 않도록 과감히 잘라낸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작가가 되기 힘들다.
셋째, 애초에 전체 그림을 잘못 그린 후 장면을 짜고 서사를 전개했을 때다. 이 시인은 "아무리 매만져도 이미 볼륨이 정해져서 더는 성장 가망성이 없는 경우"라고 말한다. 시든 소설이든, 작품을 완결하려면 전체의 길이나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써나가야 한다. 세부에 집착하다 보면 "벽돌로 지은 셋째 아기 돼지 집"이 아니라 "첫째 아기 돼지처럼 초가삼간"이 나온다. 이런 어설프고 엉성한 글은 만지면 만질수록 엉망이 되기 쉽다. 이럴 땐 허물어뜨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좋다.
넷째, 실력이 모자라는 경우다. 좋은 소재와 주제를 잡아 신나서 시작했는데, 막상 쓰다 보면 공부가 덜 되었거나 경험이 부족해 더 이상 쓸 수 없겠구나,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네 번째 경우엔 그나마 희망이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여기에 해당했다. 청년 시절에 시작해서 다른 작품을 쓰면서 평생에 걸쳐서 다듬었다. 책상 속에 묵혀 두었다, 때때로 꺼내 읽으면서 틈틈이 고쳐 쓴다. 경험이 쌓이고 공부가 깊어져 이 글을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 시인은 말한다.
"작가로서 쓰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글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아 있다. ‘쓰다 만 글’이라고 해서, 실패작들이 모여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미완성이기에 미지의 걸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 글들은 반드시 무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자. 시작한 것이 나였으니, 분명 멋진 끝맺음도 내 두 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진정한 재능은 꾸준히 쓰되, 언제 쓰던 글을 멈추어야 할지,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할지 깨닫는 힘일지도 모른다. 자기 글에 관한 감식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작가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나친 자책과 완벽주의는 좋지 않다. 자칫 ‘작가의 벽’에 갇힐 수 있는 까닭이다. 작가의 벽이란, 두려움과 의심 탓에 좌절해서 중도에 글을 포기하거나, 아예 글을 쓸 수 없게 되는 걸 말한다. 허먼 멜빌, 프란츠 카프카, 버지니아 울프, 조앤 롤링 등 수많은 시인과 작가가 작가의 벽 앞에서 방황하고 절망해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작가가 되려면 친구가 필요하다. 꾸준히 기회를 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편집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좋은 글을 쓰기만 바라는 지인이 있어야 작가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천쉐는 말한다. "친구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줄곧 이 사실을 일깨우는 것만 같았다. 나는 글을 쓰며 잘 살면 된다고, 일부러 무언가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과 좌절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작가들에게 아낌없는 우정을 베푸는 이가 없을 때 좋은 문학은 태어나지 않는다.
지금 뜨는 뉴스
장은수 출판문화평론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장은수의 책으로 읽는 세계]쓰다 만 글이 되는 네 가지 이유](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31119053263716_1741687533.jpg)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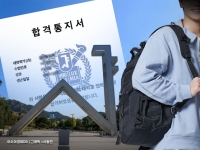

![쿠팡 잡으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13년 만의 '변심'에 활짝 웃는 이곳[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42307522530624_174536234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