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기자의 체독(體讀)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
영어제목 monster 아닌 host
싫든 좋든 함께해야할 운명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푸코까지
사회와 개인에 대한 생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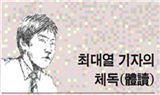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인 대다수는 스스로 사회 속(in)에 있다고 여긴다. 늑대인간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태어나고 자라서 죽는 과정까지(혹자는 사후까지도) 사회 안에서 일어난다(혹은 그렇다고 믿는다).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셈이다.
최근 나온 신간 '괴물과 함께 살기'의 저자 정성훈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그가 보기에는, 근대 이후 '현대 사회'는 괴물이 됐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가 아니라 함께(with) 살고 있다. 괴물은 좋다 혹은 나쁘다 식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어찌 됐건 같이 살고 있는 괴물, 곧 현대사회를 다루는 지혜를 얻기 위해 탐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책은 우리나라 관객에게 친숙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로 시작한다. 저자가 10여년 전 영화를 떠올리며 눈여겨 본 부분은 영화의 영어제목이다. 영화는 당시 시대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함의를 내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에는 말 그대로 기괴한 생명체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감독은 'monster'가 아니라 'host'를 제목으로 택했다. 괴물이란 게 낯설고 꺼려지는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빌붙어 사는 주인이자 공생하는 주인, 즉 그것이 우리와 서로 양분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주인"이라는 게 영화를 곱씹어본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의 생각은 꼬리를 물어 영국 철학자 홉스로 이어진다. 홉스는 자신의 책 제목이기도 한 '리바이어던'이 인간, 정확히는 인간의 기예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바이어던 초판의 표지에는 인간의 외양을 띤 거대한 존재가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군주인듯한 인상을 주는 거대한 존재는 곧 리바이어던으로, 표지를 자세히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 걸 형상화했다.
리바이어던은 성서에 나오는 바다괴물에서 따온 이름으로, 홉스는 인간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존재로 그린다.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있게 되면 전쟁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계약을 맺고 리바이어던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화두를 던진 게 곧 괴물의 탄생을 설명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재료로 만들었는데 괴물이 되는 것이며 게다가 인간은 이 괴물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근대 이후 홉스ㆍ로크, 나아가 20세기 후반 세상을 떠난 독일 철학자 니클라스 루만까지, 저자는 각 사상가가 남긴 텍스트 등을 토대로 사회철학의 큰 줄기를 다룬다. 괴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황과 괴물의 탄생, 이후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온 괴물이 주 관심대상이다. 저자는 문제의식을 확장해 근대 이후 위세를 떨치게 된 자유시장이나 시장경제, 대중문화도 같은 방식으로 연구할 대상이라고 진단한다.
괴물, 곧 현대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하는지에 중점을 둔 만큼 20세기 이후 현대 철학자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악의 평범성을 주창했던 한나 아렌트를 비롯해 위르겐 하버마스, 미셸 푸코 등의 주요 저작과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은 제한된 지면에 복잡한 설명을 담아야했던 탓에 다소 난해한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각 철학자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답을 구했는지를 설명하며 이를 간략히 비교해줬기에 개념에 대해 한결 선명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
특히 니클라스 루만에 대해 따로 장을 마련해 상세히 설명한 부분에서는 일찌감치 그의 이론을 따져가며 공부해 왔던 저자 자신의 이해도가 더해져 있다. 과거보다 많이 알려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국내에 덜 소개된 루만의 이론을 쉽게 풀어 불특정 다수 독자의 관심을 높이려는 점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저자의 친절함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책의 제목은 수년 전 저자 본인이 직접 진행한 교양수업에서 따왔다. 저자는 책을 펴낸 동기와 의도하는 바를 꽤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서두에 책의 목표가 "괴물과 함께 살아온 지난 200~300년간 서양 철학자와 사회학자가 어떻게 괴물과 씨름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름을 떨치고 있는 철학자의 이론이나 철학사를 따져보는 건 단순히 앎의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적 허영(虛榮)을 포장하는 수단이 아니란 얘기다. 나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고민할 때, 누군가 한발 앞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던졌을 테고 그에 대한 답을 좇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나 칸트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시 시대에서 왜 그런 의문을 가졌는지 궁금히 여기거나 그들 자신이 치열하게 사고했던 태도는 수백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정치하게 이어져야 할 삶의 요소라고 나는 여긴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괴물과 함께 살며 누리는 즐거움과 그로 인해 겪는 괴로움, 그리고 괴물 덕분에 획득한 능력과 그로 인해 포기한 능력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이다.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여전히 짐승이나 괴물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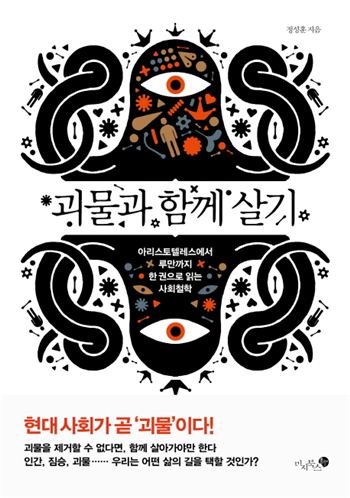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509342429558_17702516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