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기의 책보기]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
아버지란 '아침이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간과 쓸개를 신발장에 떼 놓고 출근하는 사람'이다. 지난해 연말 좀 특이한 책이 나왔었다. 2006년 장편소설 '내 머릿속의 개들'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았던 소설가 이상운의 '아버지는 그렇게 작아져간다'는 산문집이었다. 책 제목만으로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씨처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세상의 을(乙)로서 온갖 갑질을 견뎌내며, 쪼그라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는 소설가이자 강단에 서고 있던 중년의 아들이 정확히 1,254 일(3 년 4 개월) 동안 병석의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써낸 간병일기였다. 짧지 않은 기간인데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 속담이 무색할 정도의 지극정성이 깃든 저자의 효도가 필자의 마음을 울렸다.
중견 소설가로서 아버지를 떠나 보내는 아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두 번 째다. 아들이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생기는 두 사람의 심리변화, 가족들 간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유형과 해결 방식, 국가 차원의 의료 및 간병 지원 제도와 시스템 개선 안까지 꼼꼼하게 파악함으로써 다른 간병인들에게 도움이 될 성 싶은, 귀한 책이었다.
그럼에도 '특별한 소설가 아들의 특별한 행위'쯤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 싶게 뒤이어 출판된 책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을 읽자 그 생각이 바뀌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아들들이 많을 것, 사회문화인류학적 차원에서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은 것이다.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이야기다. 지난 40여 년 사이 일본에서 부모를 간병하는 아들의 숫자가 6 배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형제 수 감소, 외동 아들, 늦은 결혼이나 독신 증가, 여성(며느리와 딸)의 사회활동 증가와 전통적 가치관 변화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들 아닌가? 그대로 우리의 말들인 것인데, 그럼 우리도 간병하는 아들들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아들이 간병하면 하는 것이지 그 무슨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기혼 남성의 경우 더욱 그렇다. 여차하다간 부모 간병하다가 처자식과 헤어지는 수가 있다. 형제지간 우애가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직장까지 다녀야 할 경우 엎친 데 덮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간병하는 아들의 '조건'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는 복잡하고 다단하다.
간병하는 아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결국 아내가 영순위고 다음이 형제, 친구, 직장 동료들의 현명한 배려다. 아들 스스로 위축되지 말 것과 부모에게 폭력적이지 않을 것도 중요하다. 부모를 집에서 끝까지 모시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시설'이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남성은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 / 히라야마 료 / 어른의시간 / 1만 5천 원)
지금 뜨는 뉴스
북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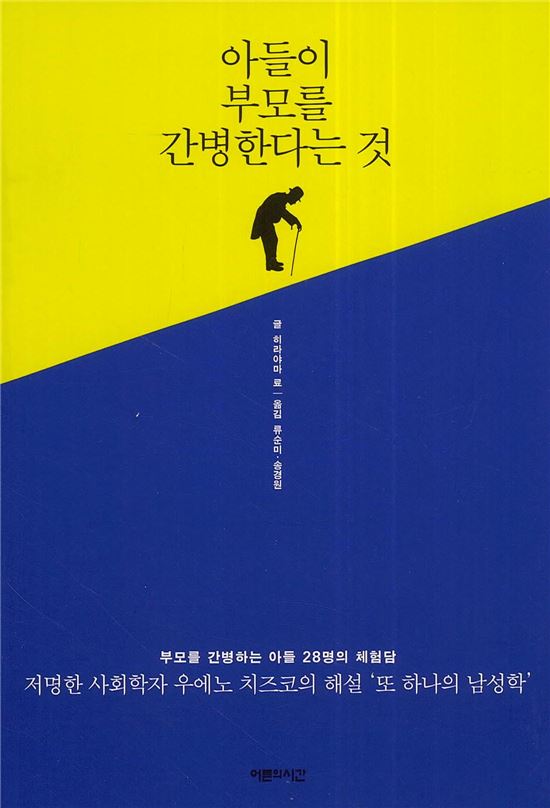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北 김정은 얼굴 '덥석'…'예뻐해 함께 다닌다'는 김주애가 후계자? 아들은?[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3042407464898154_1682290007.jpg)





!['나의 최애'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 보러 '북적'…다카이치 팬덤활동 '사나카츠' [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15583038893_177079311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