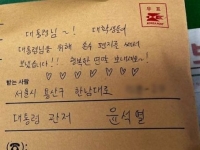브랜드 순위서 아시아 중위권으로 추락
'통신업' 해외 진출 성과 사실상 없어
신사업 분야도 구체적 BM도 확보 못해
"사장 취임 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최휘영 당시 대표를 만나 지분 10%를 스와프(교환)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중수 전 KT 사장은 통신사 수장으로서 한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네이버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꼽는다. 그는 2005년 KT 사장 자리에 오르기 직전 당시 야후와 다음을 제치고 막 포털 1위를 차지한 네이버 최고경영진을 만나 서로 주식을 교환하고 사업을 같이하자는 논의를 했다. 당시 네이버는 떠오르는 벤처기업이었지만 시가총액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KT는 시총 11조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 통신업체였다.
하지만 실제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일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인 KT 임원들이 주식교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남 사장은 훗날 "후회한다"며 "임원 회의보다는 주도적으로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7일 현재 네이버 시총은 약 30조4300억원, KT 시총은 8조3500억원이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KT는 한국 정보기술(IT) 사업의 주도권을 쥘 기회를 놓쳤다. 이후 수조 원의 돈을 미래 신사업에 쏟아부었지만 정작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KT뿐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가 십여년간 탈 통신을 부르짖었다. 기회는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20년 전 젊은 기업, 혁신 기업 대명사였던 통신사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으로 전락하는 중이란 평가를 받는다. 아시아경제는 통신 전문가 20명을 선정해 한국 통신산업의 문제와 과제, 미래에 관해 묻고 들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세계적인 브랜드 평가기관인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는 매년 전 세계 통신사 150개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다.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아시아의 통신회사가 있다. 베트남 최대 통신사인 비엣텔이다. 2018년 47위였던 비엣텔은 올해 16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28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KT(40위), LG유플러스(68위) 역시 비엣텔보다 순위가 낮다.
비엣텔이 높게 인정을 받은 이유는 눈부신 글로벌 성적 덕분이다. 인근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물론 중남미 페루와 아이티,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등 10개국에 진출했다. 이 중 5개 나라에선 시장 점유율 1위다. 지난해 매출 약 9조원 가운데 해외 매출이 4조원 정도였다. 비중이 40%가 넘는다.
베트남 국방부 소유 기업인 비엣텔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국산화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이 기술을 무기로 경제 수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갔고, 시장 개척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통신사로 거듭났다. ‘통신 영토’ 확장을 위해 지난해 투자한 금액이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해외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KT의 경우 10년 전 아프리카 르완다에 진출한 이후 누적 손실만 2500억 가까이 기록했다.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본업'도 신사업도 못 하는 국내 통신사
전 KT 사외이사이자 최근 KT 대표직에 도전했던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장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엉뚱한 시장을 공략하거나 제대로 자본을 투입하지 못한 탓에 해외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대신 국내 이통 3사는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우물 안 경쟁'에 몰두했다. 3사 합계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4조원이 넘는다.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데 굳이 혁신과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이 기대고 있는 내수 시장은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2050년에는 현재보다 인구가 50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평균 1.6개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쓴다. 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900만명 줄어든다는 의미다. 차 교수는 "다른 나라 시장을 공략해서 '본업'인 통신업의 파이를 키우든지 아니면 신사업을 통해 체질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통신회사는 이웃 나라 일본의 소프트뱅크다. 일본 통신 시장 점유율 3위인 소프트뱅크가 눈을 돌린 분야는 '투자업'이었다. 2017년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비전펀드'라는 벤처 캐피탈을 만들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했다. 대표적으로 쿠팡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래가 불투명했던 기업에 과감했던 투자는 달콤한 열매로 돌아왔다. 이후 뉴욕 증시에 상장됐고 지분을 일부 팔아 현금화한 금액이 33억7750만달러다. 투자금은 이미 회수한 셈이다. 소프트뱅크는 여전히 쿠팡의 최대 주주로 4억2615만6413주(27일 현재 약 10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소프트뱅크는 '탈 통신' 선두주자로 거듭났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2021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 중에 소프트뱅크의 비통신 매출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다.
'말로는 탈 통신'…절실함은 안 보인다
![[갈라파고스 K-통신]①베트남에도 밀리는 한국 통신 3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102510595628117_1698199196.jpg) 헬스케어의 경우 통신 3사가 십수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모두 실패를 거듭했다. SKT가 3년 전 450억원을 투자한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홈페이지도 개편 진행 중이며 이용할 수 없다[사진출처=인바이츠 헬스케어 홈페이지]
헬스케어의 경우 통신 3사가 십수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모두 실패를 거듭했다. SKT가 3년 전 450억원을 투자한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홈페이지도 개편 진행 중이며 이용할 수 없다[사진출처=인바이츠 헬스케어 홈페이지]
우리나라 이통사들도 '탈 통신'을 외치며 신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이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도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들이 신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만한 무언가가 과연 있었느냐"며 "혁신에 대해 절실함보다는 기존 수익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통신 3사는 매출액의 70% 이상을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TV(IPTV) 등 본업에서 올린다. 대규모 투자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용화하면, 이후로는 큰 노력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래서 물이 깊고, 물살이 거센 곳에서 헤엄치는데 서투르다. 신사업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수익화에 성공한 경우가 일부 있긴 해도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신사업은 당장 버는 돈보다 비용이 더 많은 사업이다. 신사업 부서는 돈을 벌어오는 '본업' 부서의 눈치를 봐야 한다. KT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 교수는 "회사 내부에서 '돈 먹는 하마',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신사업 부서를 백안시하기도 한다"며 "위험을 감수하거나, 혁신하려는 DNA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사업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의 경우 통신 3사가 십수 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모두 실패를 거듭했다. 야심 차게 핵심 사업부를 분사해 합작사를 출범했으나 지속된 사업 부진에 발을 뺐고, 대대적으로 앱을 출시했다가 조용히 내리기도 했다. 5G 상용화 초기 킬러콘텐츠로 밀어붙였던 클라우드 게임, 혼합현실(XR) 관련 신사업도 5G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는 모두 유명무실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IT 기업과 달리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통신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학 교수는 "통신사가 AI 등 신사업을 하려면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자회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본사는 경영 간섭 없이 재무적 투자자 역할만 하고, 자회사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새로운 뭔가를 해 성과를 내려면 돈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뼈아픈 이야기다. 실제 통신업계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갈라파고스 K-통신]①베트남에도 밀리는 한국 통신 3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102510542728106_1698198868.jpg)
![[갈라파고스 K-통신]①베트남에도 밀리는 한국 통신 3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102417212627306_1698135685.jpg)
![[갈라파고스 K-통신]①베트남에도 밀리는 한국 통신 3사](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102417315127307_16981363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