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6년6개월 만에 '법적' 종지부…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몸 바친 조직으로부터 난데없이 범죄자로 몰린 '악몽'…신한, 입장 밝혀야"
-"3년 전 항소심 판결, '치유의 기회' 있었으나 놓쳤다"
-"단 하루, 명예로운 퇴임 원해…진정한 마무리의 키는 신한이 쥐고 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내부 경영진을 고소하면서 벌어진 이른바 '신한사태'가 6년6개월 만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9ㆍ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ㆍ배임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다. 일부 횡령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길었던 법정공방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신한사태는 아직 진행형이다.
◆끝?…신상훈 "신한이 응답해야"=최종심 판결을 받아든 신 전 사장은 10일 "다소 아쉽지만 터무니없는 누명은 벗었다"며 "사태의 본질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제는 신한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신한은행의 고소고발로 사태가 시작됐고, 조직의 자원을 동원해 왜곡된 사실로 주주ㆍ이사회ㆍ국민을 기만한 만큼 '당사자'로서의 신한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의 의미를 묻자 그는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신한의 대표자"라고 답했다.
지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신 전 사장은 한참이나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성우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는 시를 언급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뗀 그는 "평생 몸 바친 조직으로부터 난데없이 흉악한 범죄자로 몰려 고소당한 기억은 당혹스럽고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이면에 사전에 기획된 음모가 자리 잡고 있었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 작업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며 "혼자 멍에를 지고 묻어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내 분신과 같은 조직의 불의를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범죄가 될 것이란 생각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덧붙였다.
◆6년6개월…깊어진 갈등=이번 상고심 판결은 3년 전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항소심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한 경영진이) 알았을 텐데도 철저히 무시됐다"며 "당시 판결이 존중되고 사태 원인을 바로 살폈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상처와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그 '치유의 기회'가 무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나를 사태 주무자들과 한 데 묶어 '조직 가치를 훼손하는 무리'라고 매도하고, 진실을 증언한 후배들을 '신상훈 파벌'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인사 상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마무리' 열쇠는=향후 계획을 물었다. 신 전 사장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명예회복'을 바라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 하루라도 명예롭게 퇴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미지(사회적 평판), 커리어(직업), 이모셔널(감정적) 데미지(피해)가 너무나도 컸다"며 "신한사태의 진정한 마무리는 신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키(Key)는 그쪽에서 쥐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쫓겨나듯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나야 했던 신 전 사장은 7년여 법적 싸움을 끝낸 지금, '단 하루'의 명예로운 퇴임을 희망하고 있다.
신 전 사장은 "과연 '신한다움'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난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고 주주와 고객,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죄할 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릇된 언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동료에게 피해를 준 당시 위증자들에게도 개인적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무고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말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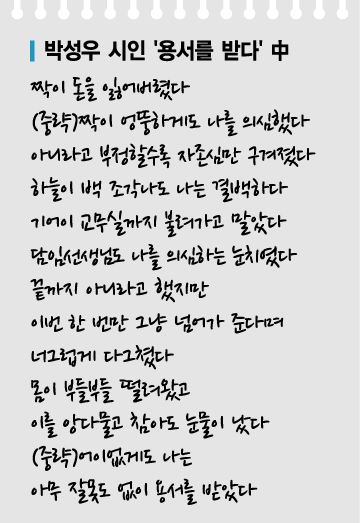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속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911364534184_177060460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