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뜨거운 감자였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애플 주식을 매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투자 규모는 10억7000만 달러. 버핏은 우리 돈으로 약 1조2599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 애플 주식 1.8%(981만 주)를 사들였다.
버핏의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의 경우 분기 단위로 증권 감독 당국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의문은 한 가지였다. 과연 애플에 대한 투자가 버핏의 결정인가 여부다.
공시 주체는 버핏이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의 회사지만 모든 결정을 버핏이 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특히 버핏은 평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업계에 대한 투자는 피한다"는 철학으로 정보기술(IT) 분야 투자를 기피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핏이 이메일을 통해 '애플 주식 매입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WSJ는 버핏이 직접 채용한 펀드매니저인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가 최근 몇 년 동안 독립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결정해왔다고 분석했다.
버크셔는 애플 외에도 IBM의 지분을 8120만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19만8853주나 늘었다. 버핏은 최근 야후 인터넷사업 부문을 인수하려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2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애플 주식 매수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는 버핏의 이메일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IT사업을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목격한 건 '버핏 효과'였다. 버핏이 매집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그간의 부진을 뒤로하고 4%나 뛰어올랐다.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이 중국 사업 부진에 따라 애플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고 방송에서 떠들면서 폭락했던 애플이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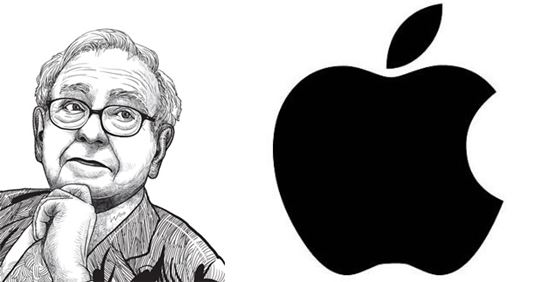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굿모닝 증시]뉴욕증시 AI주 급등…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11506280389199_17368900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