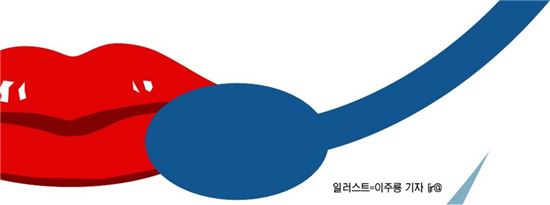팔순 맞은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114
1935년 개국, 빠른 안내 위해 '네'로만 대답
80년대, 군사정권문화 배어든 속전속결 응대
2000년대, 고단한 삶 위로 '사랑합니다' 멘트
ICT기술 발전에 상담원 수 '절반'됐지만 앱 등으로 스마트 시대 대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네~ 고객님"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인 '114'가 올해 팔순을 맞는다.
'114'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35년10월1일이다. 경성중앙전화국 교환방식이 기존 공전식에서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내가입자 전화번호 문의는 '114'가 아닌 '100'이었다. 또 시내교환 신고는 '116'이었고, 호출전화 신청 '108', 시내 통화의 취소 및 변경과 정시 통화 신청 '104', 화재 '119' 등의 특수번호가 사용됐다. 이 중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특수 번호는 100ㆍ114ㆍ119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114' 상담원의 첫 멘트에는 영욕의 한국 근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비스 초기인 1935년 당시 상담원 안내 멘트는 "네"였다. 일제강점기다운 단순 명료한 인사다. 안내 속도에 중점을 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인사 멘트는 1970년대까지 유지됐다. '일제 식민지-광복-한국전쟁-근대화'로 이어지는 먹고살기 힘들 시절인 만큼 멘트는 짧았다.
1980년대에는 "○○호입니다"라는 사무적 응대로 바꼈다. 책임있는 상담을 위한 변화였다는 설명이지만 고객들 역시 문의를 마치면 바로 전화를 끊는 식이었다. 그야말로 군사정권 당시 문화에 어울리는 '속전속결'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때로는 "안내입니다"라는 인사말도 썼지만 고객들이 "안 됩니다"로 잘못 알아듣고 "뭐가 자꾸 안 되느냐"라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다시 "네"로 돌아갔지만 억양에 변화를 준 "네, 네"로 과거와 차별화시켰다. 1997년부터는 가장 널리 기억되는 "안녕하십니까"가 등장한다. 특유의 '솔' 음정으로 시작하는 말투와 방식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공교롭게도 외환위기가 밀어닥친 때였다. 상냥한 인사말 속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스며 있다.
2006~2009년 말까지 대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멘트도 그만큼 세상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반증이었다. 이후 "편리한 정보 114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등의 잦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 사용하는 "네~고객님"이란 짧은 인사말은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114'에는 국민들의 애환과 수많은 삶의 뒷얘기들이 담겨 있다. 반말과 거친 욕설 등으로 감정노동자인 상담원들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때로는 실연한 청춘들의 넋두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외된 노인들의 말벗은 물론 성난 서민들의 화풀이 상대도 됐다. 강도에 당황한 나머지 112로 착각하고 '114'에 전화를 걸은 소비자를 위해 상담원의 기지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평생 그런 말을 듣는 날이 없을 줄 알았다"며 눈물을 보인 할아버지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구애를 한 남자 어린이와의 천진난만한 대화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다.
또 한 남성은 맨홀에 빠져 너무 당황한 나머지 '114'에 전화를 걸어 "114죠? 119가 몇 번인가요?"라고 문의한 웃지못한 사연도 있었다.
80살 된 '114'가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114'의 존재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굳이 '114'에 전화할 이유가 없어진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14 상담원 수도 급격하게 줄었다. 1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CS측은 "114 상담원 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면서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 음성보다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