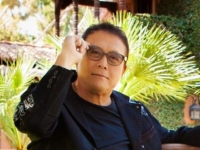[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덕수궁 석조전 별관 사용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현재 덕수궁 석조전은 문화재청이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 개관을 목표로 복원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전체 공정률의 75%에 이른다. 오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을 앞두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통예술인들은 지난해 말부터 전승가들의 전용 전시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자고 주장,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예능협회는 수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토론회 개최 및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석조선 사용 문제 제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 등은 "비록 덕수궁 부지가 문화재청 소유라고 해도 건물은 문체부 소유이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을 내놓으라'는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이하 예능협회)의 요구는 무리"라며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에서 부지와 예산을 확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정부 소관부처마저 묵살할 정도로 지독한 무관심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 300여명은 지난달 23일 궐기대회를 열고 "덕수궁 석조전 별관을 무형문화재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집단행동을 펼쳤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주장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1975년 문화재청이 문체부 문화재국에 소속돼 있을 당시 문체부는 덕수궁 석조전 별관을 현대미술 전시관으로 전환했다. 이어 문화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 독립한 1999년부터 덕수궁 부지는 문화재청, 덕수궁 석조전 별관은 문체부 재산으로 분할, 관리해 오고 있다. 예능협회는 "문화재청 독립 시 별관 소유권 및 사용권 비율을 50대 50으로 합의하고도 문체부가 여전히 무시하고 홀대한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인 국립현대미술관 사용을 재검토, 무형문화재 전승에도 공간을 할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능협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체회의를 열고 "무형문화재가 우리 문화자산으로 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덕수궁 석조전 별관 사용권 관련 공문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국립현대미술관은 문체부를 대신해 "덕수궁 석조전 사용권 전환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예능협회와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지난 4·7월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몸살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도 예능협회에 동조, 석조전 별관 사용권 찾기에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결국 석조전 사용권 문제를 둘러싼 국립현대미술관과 예능협회의 싸움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대리전인 셈이다. 최기영 예능협회장은 "무형문화재 전용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10만여 회원들은 합심해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촉구했다. 싸움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단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사실상 사용권 전환을 거부한 상태지만 덕수궁 석조전의 역사성, 각 기관의 역할, 전통문화예술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특히 문화예술계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공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즉 문체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냥 외면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이다.
덕수궁 석조전과 분수대는 1900~1910년에 걸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석조건물로 근대화된 대한제국의 상징이다. 덕수궁 석조전은 1899년 영국인 하딩(J.R Harding)에 의해 설계돼 이오니아식 기둥들과 정면의 삼각형 지붕(박공) 등이 특징인 신고전주의풍 건물이다.
석조전은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3층은 궁궐내전(황제 및 황후의 침실, 욕실, 휴식공간), 2층은 접견실, 홀 등의 공적 공간, 1층은 로비 및 현관으로 이뤄져 있다.
고종 승하 후 일제는 자국민을 위한 미술관으로 개조, 활용해 왔다. 창경궁이 동물원 등으로 바꾼 것처럼 조선 역사 지우기 등 공정의 일환 혹은 증거 인멸의 장소인 셈이다.
더욱 기구하게도 덕수궁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왕가 미술관’으로 변형됐고, 해방 이후 미소공동위원회 회담 장소와 유엔한국위원단 사무실 등으로 사용됐다. 1950년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방화로 내부가 소실되고 구조체 일부가 파괴되기도 했다.
1954년 육군공병단이 복구한 석조전은 1955년 국립박물관, 1973년 국립현대미술관, 1992년 궁중유물전시관, 2005년 덕수궁관리소 등으로 활용되면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덕수궁 석조전은 다른 궁궐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99년 문체부 및 문화재청 재산으로 분할돼 갈등 요인으로 얽혀 있다.
일단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13일 서울 삼청동 서울관이 개관함에 따라 덕수궁관(97년 개관), 과천관(86년 개관), 청주관(2015년 완공 예정) 등과 더불어 미술관 4관체제를 이루게 된다.
최공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중요 무형문화재에는 수천년 이어온 기술과 디자인, 회화 등 예술성이 배어 있는 작품이 많다"며 "1960년대 문화재 보호법이 생겨 장인들은 '무형문화재'로 우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고 토로한다. 최 교수는 또 "민족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표현하는 예술적, 문화적 속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을 지닌 만큼 보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현장]"전통예술 홀대가 빚은 문화 학살"…덕수궁 전쟁](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110407015453585_1.jpg)
![[이슈&현장]"전통예술 홀대가 빚은 문화 학살"…덕수궁 전쟁](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3110407015453585_2.jpg)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