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보다는 엄마 혹은 아내라는 무명의 존재로 살아가던 중년의 나미(유호정)는 병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춘화(진희경)를 만난다. 암 투병 중인 춘화의 소원은 그 시절 함께 어울렸던 패거리 ‘써니’의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모으는 것. 춘화의 등장은 무미건조한 나미의 삶에 즐거운 숨을 불어넣고 결국 흥신소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나미의 친구 찾기는 시작된다. 오래된 비디오 속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디스코 리듬에 맞추어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뻗던 친구들은 이제 모두 다른 사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10_LINE#>
서울로 상경한 여성 판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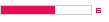
<써니>는 목표점과 지도가 분명한 영화다. 중년의 여성들이 여고시절 친구를 찾아가는 여정은 모객의 대상이 확실하다. 전설의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와 10대의 해방구였던 <젊음의 행진>, 영화 <라 붐>의 인상적인 헤드폰 신, 보니 엠의 ‘써니’,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까지. 80년대 과거의 문으로 들어가는 추억의 열쇠들은 필요한 순간 바로 관객의 손에 쥐어지면서 제 아무리 초행자라고 해도 좀처럼 길을 잃을 일이 없을 정도다. 이제는 영화전체를 훌륭히 이끄는 심은경의 성장과 여고생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민효린의 미모, 어린 춘화 역으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강소라의 등장은 인상적이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던 첫사랑 오빠와 수지의 현재까지, 적제적소에 배치된 카메오의 캐스팅은 탁월하다.
<써니>는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는 초반을 제외하면 러닝타임 동안은 실컷 웃고 또 울 수 있는 영화임에 분명하다. 830만 관객을 끌어 모은 <과속 스캔들>의 강형철 감독은 <써니>에서 다시 한 번 대중의 요구와 맥을 집어내는 용한 실력을 보여주고,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영화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은 때로 과욕을 낳기도 한다. 한 때 노동운동을 했지만 현재는 과거와 상관없는 비즈니스맨이 된 나미의 남편이나, 노동운동에 대해 밥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언쟁하는 장면 등은 얄팍한 포장지처럼 너덜거린다. 특히 종로 한복판에서 데모대와 백골단 그리고 ‘써니’와 ‘소녀시대’가 뒤섞여 싸우는 몹신은 역사의 농도를 희석시키려는 야심찬 시도에서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그치고 만다.
여고시절은 순정물이나 만화처럼 미화되거나 전설화되고, 현실은 미스코리아에서 술집작부로 전락한 친구를 등장시킬 만큼 필요 이상으로 악화된다. 그래서 그 과거는 대책 없이 행복하고, 현실은 드라마틱한 반전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결국 달콤한 <써니>의 뒷맛은 그리 상큼하지 않다. 특히 그 추억의 보상이 결국 현재 ‘좀 사는’ 친구들의 물질적 은총이나 경제적 구원으로 마무리 될 때, 과연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씁쓸함을 감추기 힘들다.
10 아시아 글. 백은하 기자 one@
10 아시아 편집. 이지혜 sev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