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11월의 나무는, 난감한 사람이/ 머리를 득득 긁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아, 이 생이 마구 가렵다/ 주민등록번호란을 쓰다가 고개를 든/ 내가 나이에 당황하고 있을 때,/ 환등기에서 나온 것 같은, 이상하게 밝은 햇살이/ 일정 시대 관공서 건물 옆에서
이승 쪽으로 측광을 강하게 때리고 있다/ 11월의 나무는 그 그림자 위에/ 가려운 자기 생을 털고 있다/ 나이를 생각하면/ 병원을 나와서도 병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처럼/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황지우 '11월의 나무'
![[아, 저詩]황지우 '11월의 나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112315261650578_1.jpg)
■ 11월만 되면 이 시가 생각난다. 난감한 사람이 머리를 득득 긁는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라는 표현이 내 머리 속에 스티커처럼 붙어서 11월의 나무들만 보면 그 생각부터 난다. 이맘 때만 되면 생이 왜 이리 가려운가. 주민등록번호란을 쓰다가 고개를 든 시인. 11월의 낯섬을 이토록 실감나게 표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미 먹어버린 나이가 너무 낯설어지는 때, 환등기에서 나온 것 같은 햇살의 비현실감, 이승의 측광을 때리는 빛 아래에서, 생의 비듬을 털고 있는 나무들. 나는 이 당황, 혹은 납득할 수 없음의 나이에서, 이 시를 아프고도 고맙게 읽는다. 나와 같은 병명을 가진, 누군가가, 같은 기분의 같은 중얼거림으로 11월의 길을 걸어갔구나.
빈섬 이상국 편집부장ㆍ시인 isomi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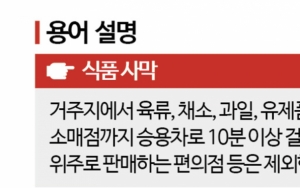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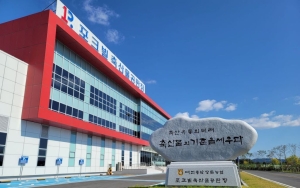














![[굿모닝 증시]'오라클 쇼크'에 코스피 하락 출발 전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4013100381948931_17066290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