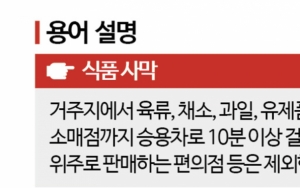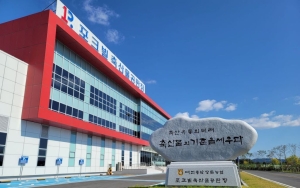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津頭江)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 오오 불설워// (.......)
김소월 '접동새'
![[아, 저詩]김소월 '접동새'](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112315215017490_1.jpg)
■ 어린 소월은 친척 여인들 사이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 옛날 평안북도 박천의 진두강 가의 마을에 10남매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 죽고나서 아버지는 계모를 들였는데, 이 사람이 성미가 고약한 거야. 큰 누나인 소녀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어. 아랫 동네의 부잣집과 혼담이 오갔는데, 그집 어른들이 소녀를 예뻐하여 예물과 예단을 많이 보냈어. 계모가 그걸 보고는 눈이 뒤집혀 예물들을 모두 빼앗아버린 거야. 울고 있던 소녀를 채찍으로 때리며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일한 물건인 장롱 속에 들어가라고 시켰어. 소녀가 오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 기름을 붓고는 불을 질렀어........" 진두강이 실제로 있는 강인데다, 박천도 알고 있는 곳이고 접동새 소리도 귀에 익숙한지라, 소년은 오금이 저릴 만큼 실감나게 들었을 것이다. 이 무섭고 서러운 접동새 스토리텔링을 스무살의 소월은 시로 표현해낸다. 들리는가, 접동새는 귀로 쓴 시이다.
빈섬 이상국 편집부장ㆍ시인 isomi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