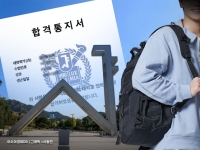이상(李箱)은 일제강점기에 나고 죽은 소설가, 시인이다. 소설 '날개'가 유명하고 '오감도'나 '건축무한육면각체(建築無限六面角體)' 같은, 제목부터 이상한 난해한 시를 많이 남겼다. 그러나 그는 누가 읽어도 뜻을 헤아리고 감정을 공유할 만한 쉬운 글도 많이 남겼다. '거울' 같은 시가 그렇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중략//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만/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 보기만이라도 했겠소//중략//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이상은 '거울'에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갈등, 즉 자의식의 분열을 드러낸다. 윤동주의 시 '참회록'에도 거울이 등장한다. 시인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밤이면 밤마다 닦는데,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난다고 했다.
'참회록'에서 녹이 낀 구리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 주는 점에서 자기 성찰의 매개체인 반면, 이상의 '거울'은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단절시키는 양면성을 지닌 대상이다. 그러니 이상의 시는 거울의 속성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울은 사물을 비춰 주지만 거울 속의 세계는 현실과 단절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속성에 반영과 차단이라는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은 영화의 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 영화는 현실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과 상상력을 스크린에 비추지만 관객에게 스크린 저편의 세계는 '갈 수 없는 나라'다.
이상은 영화를 좋아했다. 그의 몇몇 작품에 영화나 극장이 등장한다. 소설 '동해(童骸)'에는 친구와 단성사에서 만날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소설 속 주인공이 본 영화 제목은 알 수 없다. 일본영화일 가능성이 크다. 영화 속에서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한다.
"우리 의사는 죽으려 드는 사람을 부득부득 살려가면서도 살기 어려운 세상을 부득부득 살아가니 거 익살맞지 않소."
이상은 폐결핵을 앓았다. 그는 1936년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쿄에 가지만 이듬해 사상불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다. 도쿄 니시칸다 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폐병이 악화돼 도쿄 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죽었다. 그의 나이 스물여덟 살이었다. 유해는 화장해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치했으나 후에 유실되었다.
이상은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 것 같지 않다. 소설가 박태원은 "그는 그렇게 계집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벗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였으면서도 그것의 절반도 제 몸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면서 이상의 죽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살이라고 했다.
이상은 1933년 폐결핵 진단을 받은 다음 조선총독부 건축기사일을 그만두고 백천온천으로 요양을 간다. 거기서 기생 금홍을 만난 이상은 서울로 돌아와 종로1가에 '제비'라는 다방을 차린 다음 그녀를 불러 마담 자리에 앉히고 동거를 시작했다. '날개'는 이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한다.
이상은 1935년 여름 평안남도 성천에서 요양한다. 이 시기에 쓴 '산촌여정(山村餘情) '과 '권태'는 이상의 수필 중 최고를 다툰다. '산촌여정'은 같은 해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렸다. 산촌을 찾은 도시인, 사금파리처럼 예민한 시인의 감성이 짜릿하게 읽힌다. 이 수필에서도 영화에 대한 이상의 관심이 드러난다.
'(학교) 마당에서 오늘 밤에 금융조합 선전 활동사진회가 열립니다. 활동사진? 세기의 총아-온갖 예술 위에 군림하는 '넘버' 제8예술의 승리. 그 고답적이고도 탕아적인 매력을 무엇에다 비하겠습니까?'
이상은 여기서 '따불렌즈(double lens)', '후래슈빽'(flashback)', '스틸(still)', '스폿트(spotlight)' 같은 용어를 사용해 영화 지식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는 이 수필의 앞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한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수필 전체로 보아 이상은 영화사의 로고를 떠올린 듯한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파라마운트 로고는 만년설에 덮인 산봉우리다. 초창기에는 유타에 있는 벤 로몬드 산을, 지금 사용하는 로고는 스위스의 마터호른을 모델 삼아 디자인했다고 한다. '소녀'가 등장한다면 필시 컬럼비아 영화사의 로고다. 소녀라기보다 횃불을 든 여성인데, 초창기 로고의 모델은 알 수가 없다. 현재 사용하는 로고는 제니 조셉이라는 여성이다. 로고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할 때는 임신 중이었다고 한다.
huhbal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쿠팡 잡으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13년 만의 '변심'에 활짝 웃는 이곳[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42307522530624_1745362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