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을 순 있지만 키울 수는 없는 운명. 그러나 양계장 암탉 잎싹(문소리)은 감히 그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꿈을 품는다. 식탁의 음식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낼 아기를 ‘출산’하고 싶다는 꿈을. 마침내 잎싹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마당 밖 진짜 세상 앞에 서게 된다. 물론 이곳에는 시간 맞춰 제공되는 먹이도, 보장된 잠자리도,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없다. 대신 자유가 있다. 친구를 사귈, 여행을 할, 그리고 엄마가 될 자유가. 숲에서 만난 청둥오리 나그네(최민식)야 말로 이 탈출이 가져다 준 짜릿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멋지게 앞머리를 휘날리는 과묵한 남자, 나그네의 등장에 가슴이 뛰는 것도 잠시, 숲의 사냥꾼 애꾸눈과의 전투에서 나그네는 그만 장렬히 전사하고야 만다. 그리고 잎싹은 갓 태어난 나그네의 아기 초록이(유승호)를 자신의 아이처럼 거둔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소년으로 자라난 초록이 잎싹에게 말한다. “엄마, 나 날고 싶어...... 가슴이 쿵쾅거려!”
<#10_LINE#>
머물러 있는 자는 자라지 않는다. 늙어 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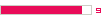
“암탉이 오리새끼를 낳았다는 거야?” 세상 동물들이 수근 대는 것도 대수롭지 않다. 낳지는 않았지만 키우겠다는 의지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엄마로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잎싹에게는 “종(種)이 다르고 생태가 다른” 아들 초록이와의 하루하루가 그저 즐겁기만 하다. 청둥오리 새끼를 홀로 키우는 암탉이라는 기본 설정을 가진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다문화, 한부모, 입양가정 등 동시대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사회적 텍스트로서의 영리한 뇌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뜨거운 심장은 시대불문의 보편적 감정에 의해 박동한다. 어느 날 선물처럼 안겨진 작은 생명체가 세상의 많은 여자들에게 주었던 기쁨, 자식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 주었던 어머니들의 희생, 그리고 더 큰 세상을 꿈꾸며 그녀들을 등지고 날아올라야 했던 모든 자식들의 연민 같은 감정 말이다. 결국 이 보편의 그물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는 <마당을 나온 암탉> 앞에서 맥없이 웃거나 한없이 울 수밖에 없다.
동화작가 황선미의 용감한 원작과 오성윤 감독의 세심하고 위트 넘치는 연출, 제작사 명필름의 뚝심과 의지로 빚어낸 <마당을 나온 암탉>은 ‘6년의 긴 제작기간’이 자찬의 도구가 아니라, 완성도를 위한 절대시간이었음을 가슴 벅차게 증명해 보인다. 특히 ‘선녹음-후작화-본녹음’의 단계를 거쳐 제작된 <마당을 나온 암탉>은 극영화배우들이 참여해 드라마틱한 기운을 더했다. 강렬한 등장과 퇴장을 보여주는 나그네 역의 최민식은 이글거리는 눈을 가린 목소리만으로도 새삼 이 배우의 가치와 에너지를 실감하게 만든다. 또한 숲의 공인중개사이자, 세상의 ‘고민중계’도 서슴지 않는 달수 역의 박철민의 존재감은 상당하다. “세월아 너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너 혼자 가면 어떡하니” 같은 구성진 탄식은 이 영화가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방학용 계절상품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어린 초록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성장해가듯, 들꽃 하나 꼬리에 꽂고 길을 떠났던 철없던 엄마 잎싹 역시 자식을 키우면서 함께 성장해나간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이 영화의 결말 역시 모성을 핑계로 한 무조건적 희생의 강요보다는 한 생명이 삶의 즐거움과 소임을 다한 후 기꺼이 맞이하는 가장 주체적인 엔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꽃이 아니라 ‘잎사귀’로 살아간 여자들, 그래도 행복했다 말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한때 그들이 품었던 모든 자식들을 위한 영화가 오늘, 마당으로 나왔다.
<10 아시아>와 사전협의 없이 본 기사의 무단 인용이나 도용,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0 아시아 글. 백은하 기자 one@
10 아시아 편집. 이지혜 sev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수능 마친 고3들 '필수 코스'였는데…요즘 청년들, 면허 취득 미룬다는데[세계는Z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510301943056_1771119019.jpg)
!['나의 최애'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 보러 '북적'…다카이치 팬덤활동 '사나카츠' [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15583038893_1770793111.png)

![잘못 봤나? 가격표 다시 '확인'…등장할 때마다 화제되는 이부진 '올드머니룩'[럭셔리월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0919492186081_17679557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