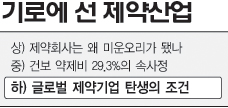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미국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21.2%를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한다. 규모는 280억 달러로 미국 제약사들이 쓰는 한 해 연구개발비 총액의 66%에 달한다. 아시아 유일한 신약강국 일본도 1년에 2645억엔을 써 제약산업 R&D 비용의 22%를 충당한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 중 신약개발 관련 금액은 1.0%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에 칼을 대며 항상 거론하는 것이 "한국 제약사의 R&D 투자율이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고 들자면 우리 정부도 그리 할 말이 많지 않은 셈이다.
◆"신약은 국가 미래 프로젝트다"
정부가 사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부터 짚어보자. 선진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는 식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거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정부는 제약사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한다.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선진화지원팀장은 "신약개발 성과는 수출 증진 등 상업적 차원을 넘어 질병 퇴치, 국민의료비 절감이란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며 "주요 국가들이 길게는 100년 전부터 신약개발을 지원해온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의지는 만족스런 수준이 아니다. 우선 절대 예산이 너무 적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이 내놓은 2011∼2019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의 국고지원금은 5300억원으로, 9년간 쓰겠다는 돈이 26개 국내 제약사 1년 R&D 예산보다 적다.
또 정부 지원 317개 신약개발 과제 중 95.3%가 10억원 미만의 소형 프로젝트다. 후보물질 발굴을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과제가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없다. 정 팀장은 "3개 부처로 흩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전문부서인 복지부로 집중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는 당장, 산업지원은 차후에
전략 부재와 의지 부족은 최근 발표된 복지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대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혁신기업 선정 및 약가지원' 등 방안이 연구개발의 질보다는 단순 수치(매출액·투자액 %)만을 적용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복지부가 약가인하 발표후 제시한 산업 지원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아쉽게 느껴진다"며 "가격인하라는 채찍 외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라는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약에 대한 합리적 가격 책정,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도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를 경계하고 나섰다. 그는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유연하게 퇴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고, 인수합병이나 사업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잘 적응하는 기업에겐 기회될 것"
약가인하에 반대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제약사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낮아진 약가는 외국 제약사들로 하여금 복제약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신약 마케팅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약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약사들이 방만한 판매관리비를 줄이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다면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대적 약가인하 정책이 나타낼 효과로는 '상위 제약사로의 시장 흡수'가 꼽힌다. 보건산업진흥원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생산시설 규제, 리베이트 영업 근절 등 2가지 정책만으로도 78개 제약사가 퇴출이나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이 차지하던 1조 8900억원 시장(전체 시장의 약 10%)은 상위 업체로 편입될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 확보가 필수적인 제약산업에는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제약의료산업전공)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업체간 인수합병 등이 발생해 제약업계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돌파구를 찾는 제약사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는 계기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나의 최애'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 보러 '북적'…다카이치 팬덤활동 '사나카츠' [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15583038893_1770793111.png)


![北 김정은 얼굴 '덥석'…'예뻐해 함께 다닌다'는 김주애가 후계자? 아들은?[양낙규의 Defence Club]](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3042407464898154_1682290007.jpg)
![잘못 봤나? 가격표 다시 '확인'…등장할 때마다 화제되는 이부진 '올드머니룩'[럭셔리월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0919492186081_17679557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