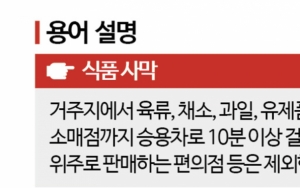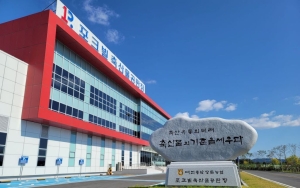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초동여담]지리산 장터목](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090807001982926_1.jpg) 류정민 사회부 차장
류정민 사회부 차장
산줄기를 휘감았던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지리산 천왕봉을 눈앞에 뒀기 때문일까. 해발 1653m, 장터목에서 맞는 바람은 특히 거셌다. '슈우웅, 휘이익…' 바람 소리가 텐트 사이를 매섭게 지나갔다.
얇은 천에 불과한 텐트에 의지해 마냥 버티기에 나선 이들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당시 장터목 주변은 야영객의 텐트로 빼곡했다. "이러다가 진짜 바람에 날아가는 것 아닐까" 사실 걱정도 됐다. 하지만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텐트 속 친구들은 '생마늘'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컵씩을 들이켰다. 입은 얼얼해지고 취기도 금방 올랐다. 천왕봉 아래에서 별빛(비록 날씨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을 벗 삼아 즐기는 야영은 나름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장터목 야영을 '낭만 여행'으로 포장하기에는 부끄러움의 '진실'이 있다. 그 높은 곳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겠나. 풀숲과 비탈로 텐트의 행렬은 이어졌고 흙바닥은 텐트 설치를 위해 마구 훼손됐다.
수많은 텐트 행렬이 취사를 끝낸 이후 남은 음식도 골치였다. 풀숲에 몰래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이들도 있었다. 한낮이 되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었다. 지리산의 자랑인 1000년을 사는 주목(朱木)의 군락도 늠름하게 서 있던 구상나무 주변도 훼손됐다.
다행인 점은 장터목 야영 얘기는 까마득한 과거형이라는 점이다. 비바람 속에 텐트에서 버텼던 경험은 20년도 더 지난 일이다. 지금 장터목 주변 야영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텐트 없이 밤을 보내는 비바크(Biwak)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장터목 대피소(정원 155명)에 예약하지 않은 이들은 하산해야 한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예약에 성공한 소수만이 장터목의 밤을 허락받는다.
'입산시간지정제'까지 시행되고 있다. 오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산 아래에서 장터목으로 올라갈 수도 없다. 분명히 불편해졌다. 과거의 낭만여행(?)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렇다고 지리산을 과거로 되돌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통제받지 않은 발걸음이 인간의 이기심과 결합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장터목, 그곳의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며 뿌리를 내리려 했던 어린 나무와 풀의 입장에서 인간의 발걸음은 가혹한 폭력이었다.
우리는 그 폭력의 시간에서 교훈을 얻었을까. 요즘 지리산 주변에서 넘쳐나는 개발 계획을 지켜보면 교훈은 이미 잊은 듯하다. 하기야 부(富)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이겠는가. 브레이크 없는 욕망의 질주, 그 결말은 무엇일까. 지리산은 오늘도 말없이 그 자리에서 '눈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류정민 사회부 차장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