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최 '미래변화와 금융 성장전략' 세미나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위원 분석
젊은 세대 자본시장 참여가 하락세 상쇄 못해
10년 뒤인 2034년부터 가계의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 자산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자본시장 참여율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참여율도 하락세를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변화와 금융의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는 특히 자본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령·세대구조 변화를 분석해 향후 가계의 자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 보유 규모는 203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2049년에는 200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향후 가구수 감소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49년까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것과 대조된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고령층의 자본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 뿐 아니라, 1990년 이후 최근 출생 세대 역시 자본시장 참여율이 이전 세대 대비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부동산, 예·적금 중심 자산보유 비중을 최근 출생 세대들 역시 답습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과 펀드로 나눠서 보면,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주식시장 참여율은 늘었으나 펀드시장 참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고령층이 적정소비를 하려면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 연구위원은 "연금이나 보유자산, 이전소득으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76% 이상의 가구가 적정소비를 대체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필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적정소비를 유지하려면 실물자산의 연금화 등 유동화가 필수적"이라며 "금융자산과 주거를 포함한 실물자산을 모두 연금화하는 경우 이 비율이 30%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자산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장기성장에 필수적인 위험자본 공급기반이 축소되는 것"이라며 "청·중년 세대가 충분한 퇴직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적금에 편중된 고령층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배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이 충분한 위험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의 소비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연금제도의 활용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령화로 가계 대출에서 고령층 차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은아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은 "고령층이 된 베이비붐 세대들은 과거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이 은퇴 이후에도 대출을 축소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인구감소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 고령층 차주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과거 레버리지를 통해 가계 자산을 확대하도록 돕는 기능을 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실물자산의 연금화와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과 소득이 평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되는 고령층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시점은 70세에 진입하는 올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고령층의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이고,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도 이 때, 주택연금의 평균 가입 연령도 72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고 팀장은 "다시 말해 다수의 고령층이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주택자산을 처분해 연금화하는 방식의 활성화는 1차적인 차원의 기대이고, 주택보유 의지도 강한 만큼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자산 연계 금융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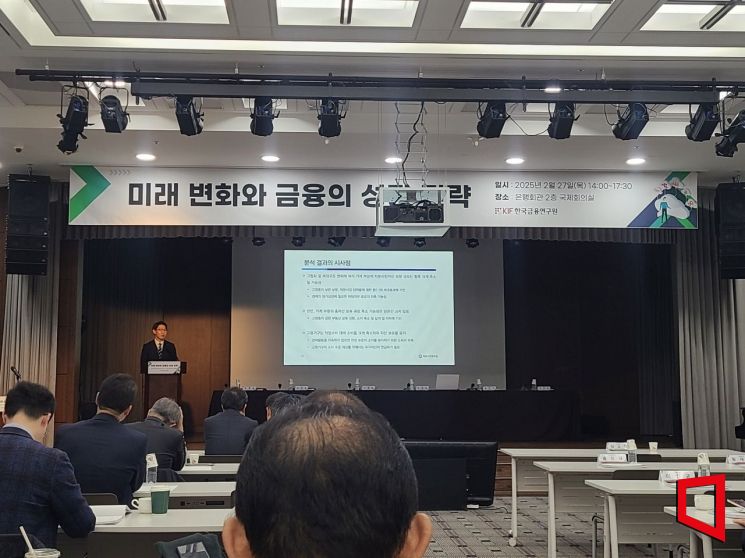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일주일 만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껑충'…머스크 언급에 기대감 커진 한화솔루션[이주의 관.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1109215637724_17707693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