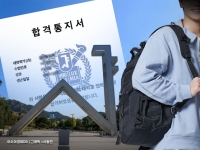![[기고]위스키 '마스킹'의 오해와 진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100706594573081_1.jpg) 이종기 한경대 생명공학과 교수
이종기 한경대 생명공학과 교수
지난 6월 KBS1 TV는 '프랑스 와인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방송은 중저가 와인 대부분의 품질이 60여개의 인공 첨가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진실을 소개했다. "포도의 품질이나 양조 비법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와인의 품질이 첨가물에 의해 결정된다면 프랑스 와인의 미래는 없다"는 프랑스 와인업계의 자성 목소리도 담았다.
필자는 처음 위스키를 접할 때 곡물과 물 그리고 효모만을 원료로 한 술의 향기가 어쩌면 이리 감미로울까 하고 감탄했다. 16세기의 맥주 순수령(보리ㆍ호프ㆍ물로만 양조해야 함)이 오늘날 독일을 맥주 종주국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30여년간 술을 제조하고 세계 여러나라 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주종(酒種)의 흥망을 재미있게 봐 왔다. 그와 함께 명주가 갖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즉 정선된 원료와 자연적인 제조 과정(미생물의 발효ㆍ자연적 숙성)을 통한 조화로 만들어진 술이라야 명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략 만들어 거친 향미를 마스킹하기 위해 여러 첨가제를 넣는 것으로는 일시적 유행을 만들 수 있으나 명주를 제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필자는 일본 양조학계의 전설로 칭송되는 사카구치 긴이치로(坂口一郞)의 저서 '일본의 술'을 읽고 비로소 근대 한국 술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 그는 '일본 전통술인 사케와 소주가 서양의 위스키나 와인에 비해 왜 저품질 술로 전락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1938년 일제가 내린 국가총동원령(國家總動員令)에서 유래됐다고 확신했다.
그 내용은 당시 군국주의 전시하의 일본은 식량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국가가 몰수하고 배급제로 통제하는 제도였다. 이때 술(알코올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함)을 공급하기 위해 주정을 대량 생산해서 거기에 각종 색소, 산미 첨가제, 감미료 등을 혼합해(이를 제성 공정이라 함) 배급했던 것이 오늘날 일본의 갑류 소주이다. 사케에도 주정을 첨가해 도수를 높이는 방법이 도입됐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에도 그대로 전파돼 막걸리에도 감미료 등을 넣는 제성 공정이 생겨났고, 한국 주세법상 제조 방법의 맨 나중 공정에 제성 공정을 넣도록 된 것이다. 이 제성 공정은 마스킹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조미료의 대명사로 한국의 식단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던 MSG가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에서 구한 원료야말로 식음료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명주를 만들려는 자성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그들이 심어 놓은 못된 제도하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 근대 술의 역사이다.
고급 술에서 숙성은 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기술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숙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마스킹하는 방법으로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연산을 표기하지 않고 마케팅으로 마스킹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위스키의 경우 최근에 범람하고 있는 기타 제재주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솔잎 추출물이나 무화과향 또는 석류향 등을 첨가한 기타 제재주 제품들은 원액 100% 위스키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같은 위스키로 혼용하고 음용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적 방법의 제조와 숙성 그리고 원액에 대한 연산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마케팅, 즉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은 침체돼 있는 위스키시장에도 시금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기 한경대 생명공학과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쿠팡 잡으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13년 만의 '변심'에 활짝 웃는 이곳[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42307522530624_1745362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