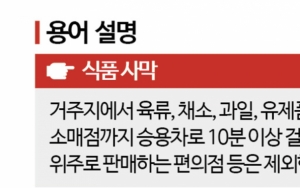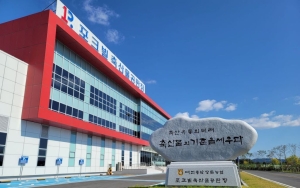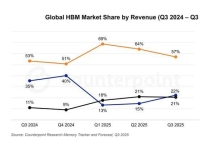[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의욕적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껍데기'만 남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책정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11억원), 토요마을학교(5억)등이 전액 삭감됐고 문화 분야에서도 여러 사업의 예산이 깎여나갔다. 사업의 대부분이 좌초됐으니 당장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시적 성과를 보는 것은 기대와 달리 어렵게 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간 정책결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제도다. 한 번 뽑은 대표들을 제어할 방법이 적은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활동에 신뢰를 보내는 주민의 수는 많지 않았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은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산을 움직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주민이 신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관련조례를 도입했다. 국내 광역시·도 중 가장 늦었다. 대신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다른 지역의 100명보다 많은 250명으로 잡았고 성별 지역 연령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하는 등 형평성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시민위원을 추첨하는 데 경쟁률이 11대 1이나 됐을 정도로 호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시의회는 주민참여제로 올라온 예산안에 일종의 '반감'을 드러냈다. 주민참여제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엄포다. 서울시 또한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시의회를 치밀하게 설득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은 '자본개선예산위'를 운영한다. 주민들의 의사가 대폭 반영되며 전문성과 영향력 또한 높다. 일찍부터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도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권자로서 지역행정에 개입하기 시작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잡기는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점차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정착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 역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