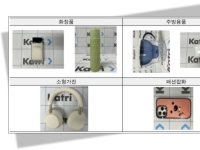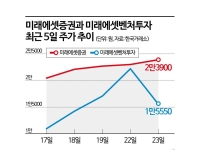미활용 폐교 367개…평균 20년간 방치
75개 폐교 있는 전남이 1위
경남·경북·강원 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교의 소멸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남은 땅의 활용 방도를 못 찾고 있다. 매각되지 못한 폐교 10개 중 3개꼴로 특정한 용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4일 교육지방자치단체 재산 조회사이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의 미활용 폐교 개수는 총 367개다.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폐교 1346개 가운데 약 27.3%가 대부, 자체활용 없이 미활용 상태라는 뜻이다. 미활용 폐교 부지 면적은 4.46㎢에 달한다. 약 625개 축구장(7140㎡) 넓이의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셈이다.
전남 지역이 미활용 폐교 75개로 가장 많았다. 면적도 88만3918㎡으로 가장 많은 땅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경남 지역 미활용 폐교 수가 72개(면적 58만2300㎡), 경북 57개(73만2617㎡), 강원 56개(87만4358㎡), 충북 29개(34만1916㎡) 등 순이다.
대한민국의 폐교는 기본이 수십 년 방치다. 조사 결과 367개 미활용 폐교는 평균 약 20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래 방치된 학교는 제주 신도초보흥분교장으로 1983년 폐교돼 42년 동안 미활용 상태다. 이외 20년 이상 활용법을 찾지 못한 폐교는 총 204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52개 ▲전남 38개 ▲강원 28개 ▲경북 22개 ▲충북 20개 ▲제주 12개 ▲경기 11개 ▲충남 7개 ▲전북 6개 ▲인천 4개 ▲대전 2개 ▲울산 2개 등 순이다.
미활용 폐교가 외딴 산속에만 있는 건 아니다. 도심과 가까운 폐교조차 마땅한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미활용 폐교 개수는 20개다. 이들 면적의 합은 23만3814㎡다.
서울의 6개 폐교는 일부가 임시방편적인 활용 용도를 찾았지만 공식적으로는 '미활용 폐교'로 분류된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8만5057㎡다.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도심 특성상 지가가 높다. 6개 폐교 부지 총 가격은 약 1769억5000만원으로 전체 367개 폐교 부지 가격 약 3722억2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덕수고 폐교 부지의 가격은 663억5452만원, 서울 성수공고는 394억7701만원, 도봉고는 231억9180만원이다. 서울은 아니지만 대전 대동초의 부지 가격 역시 154억8223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내 폐교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미활용'으로 표기된 이유는 활용법을 완전히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전문가들은 방치된 폐교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활용 폐교는 지역 소멸의 연장선에 있다"며 "향후 지역소멸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교 활용법에 대해 고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멸]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0413092045254_1746331761.jpg)
![[소멸]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42410404933332_1745458848.png)
![[소멸]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42410411333335_1745458872.jpg)
![[소멸]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42316044431958_1745391884.jpg)
![[소멸]②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51611020860351_174736092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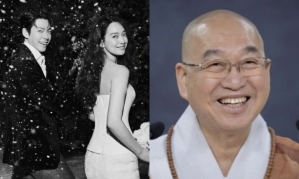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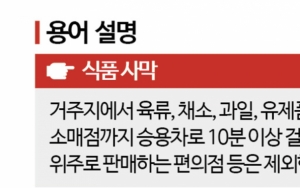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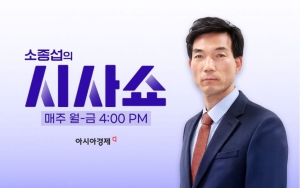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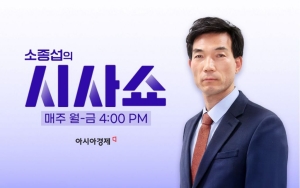



![[단독]'조폭 논란' 조세호, 패션 브랜드 결국 폐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122308485166365_17664473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