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 샷의 화두는 "무조건 탈출", 클럽 선택은 거리보다 탄도에 맞춰서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레이업의 타깃은 페어웨이."
'S-OIL챔피언스 챔프' 박지영(20ㆍCJ오쇼핑)이 지난 7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이트진로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 도중 12번홀(파4) 숲 속에서 샷을 한 뒤 공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다. 라이가 좋지 않은 건 물론 커다란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아예 정상적인 스윙이 불가능하다. 박지영은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기록하는 등 이날 6오버파로 무너져 '컷 오프'의 수모를 당했다.
아마추어골퍼 역시 실전에서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다. 초, 중급자들이라면 무조건 '언플레이어블(Unplayable)'을 선언하고, 1벌타 후 다음 샷을 기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리한 샷을 시도하다가 공이 또 다시 나무를 맞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해 더블보기이상 치명타를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골퍼들은 보통 숲 밖에 나와서 샷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선수들은 그러나 1벌타를 받아도 처음 친 곳으로 돌아가거나 '2클럽 이내' 드롭이다. 케빈 나(미국)는 2011년 텍사스오픈 첫날 샌안토니오TPC 9번홀(파4)에서 무려 16타를 친 적이 있다. 티 샷이 숲 속으로 날아가자 티잉그라운드에서 3타째를 쳤지만 공은 같은 곳에 떨어졌고, 네번째 샷은 나무를 맞고 튕기면서 몸에 맞아 1벌타를 더하는 불운까지 겹쳤다. 숲 속을 전전하다가 결과적으로 '15온 1퍼트'가 됐다.
굳이 샷을 하고 싶다면 화두는 탈출이다. 그린과 상관없이 최대한 공간이 있는 쪽으로 몸을 틀고 여건에 맞춰 공략 방법을 설정한다. 여기서 클럽 선택의 관건은 거리가 아니라 탄도다. 나뭇가지가 많아 저탄도가 필요하다면 7~9번 아이언, 페어웨이우드나 퍼터까지 동원할 수 있다. 공은 오른발 쪽이다. 페이스를 닫아 최대한 탄도를 낮춰서 가볍게 '툭' 치는 방법이다.
아래쪽에 장애물이 많다면 샌드웨지나 롭 웨지 등 로프트가 큰 클럽이다. 공은 반대로 왼발 쪽, 페이스와 스탠스를 모두 오픈시킨 뒤 폴로스로를 높게 유지해 나무를 넘기는 샷을 구사한다. 이때는 부상을 주의해야 한다. 폴로스로 과정에서 나무를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골퍼는 트러블 샷에서도 거리 욕심을 낸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탈출에 성공한 샷이 페어웨이를 지나 건너편 숲 속으로 날아가는 이유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준의 포토레슨] 박지영 "페어웨이를 확보하라"](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6101107135098178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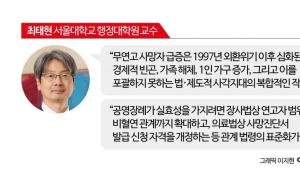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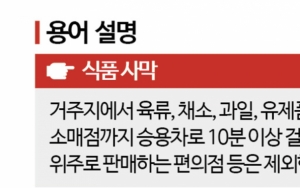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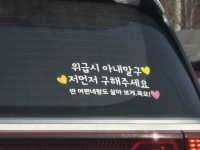



![[내일날씨]올해 마지막 날도 강추위…서울 체감 -14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123018130274452_17670859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