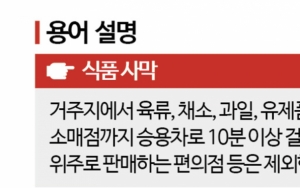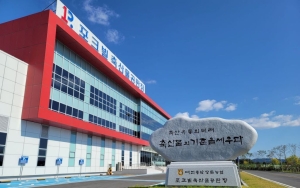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초동여담]올라타서 밀어내기](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102107023745846_1.jpg) 박철응 건설부동산부 차장
박철응 건설부동산부 차장
축제의 계절이다. 이 즈음의 하늘과 바람을 두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 가슴 떨리는 이 순간들을 쿡 찍어 눌러놓으려면 축제가 제격이다. 단풍, 억새, 코스모스, 국화에서 단감과 대추, 젓갈, 심지어 야식까지, 가을엔 온통 축제가 된다.
잊지 못할 축제의 기억 한 토막이다. 10년 전 가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선 이른바 '지상 최대의 해상 멀티미디어쇼'가 열렸다. 한 번 쏘는데 5000만원짜리를 비롯해 무려 8만발의 폭죽이 쉴 새 없이 작렬하는 불꽃축제였다.
불꽃만큼이나 잊히지 않는 장관은 그날의 인파다. 부산 인구가 350만명가량인데 광안리에만 50만명, 인근 해운대 등지에서 불꽃축제를 즐기러 모인 인원까지 합하면 100만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많이 쏘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밤하늘을 수놓던 불꽃이 잦아들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약해 놓은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됐다.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해수욕장을 빠져나오자 거리는 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였다. 거대한 사람들의 물결이 광안 전철역을 향해 서서히 일렁이듯 움직였다. 곳곳에서 고성이 난무했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싸우는 이들도 있었다. 어서 빨리 전철을 타서 그곳과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가까스로 도착한 광안역에 열차는 서지 않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정차 통과한다고 했다. 군중은 분노했지만 달리 방도는 없었다. 다음 역을 향해, 또 걸었다.
드디어 열차가 들어왔다. 이미 꽉 차 있었으나 부산역에 가야 하는 나뿐 아니라 모두들 절박해 보였다. 밀고 들어갔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람 죽겄다. 고만 타라!" 더 이상은 발 디딜 틈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차하는 역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타려 했다. 마치 피난 열차 같았다.
열차 안 사람들은 이제 새로 타려는 사람들을 막고 밀어냈다. 사다리가 있었다면 분명 걷어찼을 것이다. 직전 역에서 악착같이 올라탄 사람들이 밀어내는 데 앞장섰다. 타려는 이들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올라탄 이들은 저마다 안 된다고 소리 질렀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외쳤다. "우리는 한편이요!" 그 난장판에서도 키득거리는 웃음이 떠돌아다녔다.
그때 "좀 참고 태워 갑시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면 그는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거나 쫓겨났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다수는 힘이 세다. 우리는 모두 열차에 올라타야 한다. 그리고 열차 안 공간은 제한돼 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밀어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떠나가는 열차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소수이거나.
박철응 건설부동산부 차장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