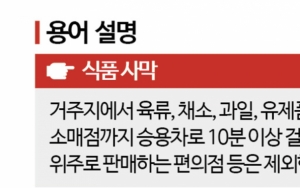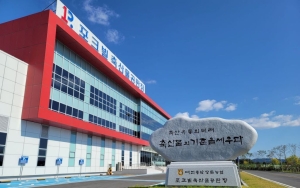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초동여담]사람, 소통 그리고 메시지](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102006580660813_1.jpg) 류정민 사회부 차장
류정민 사회부 차장
대학 시절 ○○서점 앞 벽보는 소통 창구였다. A4용지 4장 정도 크기의 백지. 다양한 필체의 글씨로 빼곡하게 메시지가 채워졌다.
'경영, 어제 그곳' '국문, 술 고프면 와라!'…. 실명은 생략됐고, 장소는 모호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이들은 빙긋이 웃고 '약속 장소'를 찾아갔다. 단골주점은 뻔했고, 그곳에 가면 어김없이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선후배가 있었다.
휴대전화는 물론 무선호출기(일명 삐삐)도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이니 불편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기다림의 여유가, 아니 설렘이 있었다. 장미꽃 한 송이 뒤로 감춘 채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있었다.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저 멀리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누군가의 어렴풋한 모습, 설렘이 현실이 된 순간이다.
그 당시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귀엽고 깜찍한 '이모티콘'도 물론 없었다. 하지만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마음을 울리게 할 수단은 있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다.
전날 밤, 감성 충만한 그 시간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에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달할 때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수줍은 미소는 진심을 담기 충분했다. 그렇게 사랑했고, 우정을 나눴고, 사람 향기를 느꼈다.
그때는 그렇게 사람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았다. 이 사회는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사람'의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그것이 삶의 버팀목이었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수단이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메신저라는 유용한 수단도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고받는 메시지는 차고 넘친다. 손편지 시대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대화 내용은 디지털 텍스트로 저장도 할 수 있다. 메신저 대화 저장은 편리한 기능일까. 오히려 부담의 이유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 의해 저장되고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 함부로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다.
사람의 향기도 소통의 의미도 찾기 어려운 수많은 문자의 조합이 전파에 실려 떠다니고 있다. 화려한 이미지의 이모티콘으로 메시지를 치장하지만, 이는 속마음을 감추려는 의도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다. 진짜 나와 디지털 세계의 또 다른 나. 화려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무미건조한 일상이다.
류정민 사회부 차장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