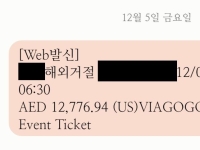정치권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기름을 부은 곳은 기획재정부다. 복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이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발끈하면서 선거철 복지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맞서 일전불사, 총력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징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복지 공약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우려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했다. 공격의 논거는 재정부가 내놨다. 재정부는 복지 TF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실현시키려면 한 해 최대 67조원, 5년간 340조원이 들어간다'고 포문을 열었다. 재정 부담 능력을 외면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입을 맞춘 듯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당의 정책 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성토했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한편으로 과잉복지를 부르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4ㆍ11 총선에서 4~5년 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나 이를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과잉 복지를 우려하는 정부 스스로 과잉 반응을 보인다. '최대 5년 340조원'의 근거부터 약하다. 각 당의 당론이나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넣어 최대치를 뽑아내는 방식이 합리적인가. 모두 불필요한 공약인가. 합리적 근거를 벗어난 문제 제기는 힘을 얻을 수 없다. TF까지 만들어 요란을 떨기보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 제대로 대응하는 게 옳다.
복지 포퓰리즘 비판은 정부뿐 아니라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된다. 그 이유를 정치권은 새겨봐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엄정한 내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것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