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에도 노후 걱정이 있었을까?’ 라는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신문에도 ‘노후 문제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마침 온라인으로 옛날 신문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지나간 신문을 한번 검색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후 문제가 예전에도 화두가 됐다고 하지만 최근 2~3년처럼 논의가 활발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 출판가에는 제2의 인생, 은퇴설계, 실버산업 등 노인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나이든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수입되어 극장가에 개봉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선 아이들 눈높이에만 맞춘 영화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요즈음 들어오는 영화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듯합니다. 문화를 소비하는 노인 소비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들여오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노년층이 존재했던 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청년시절 그 나름의 고민이 있듯, 노년층에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노년’이고 보면 시대마다 노년을 구분하는 나이에는 차이가 있었겠지요. 노년과 관련한 역사를 떠올리면 곤궁기에 부모를 버렸다던 ‘고려장’ 풍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농경시대, 한평생 몸으로 습득한 노하우를 통해 살아있는 지혜로 존경 받았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 시대에 노인으로 살았는가에 따라 노년의 가치 또한 상대적으로 변화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다수 노인의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수의 노인, 맞습니다. ‘로마시대에도 노후 걱정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노인이 다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닐지요.
인류 역사상 노인의 숫자가 이처럼 많았던 적은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이 다수인 세상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환갑잔치를 하자는 자녀의 효심에 어찌할 바 모르는 60세 선생님, 30년전 60세와 지금의 60세를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건 분명 난센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젊다고 느끼는데, 왜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틀 속에 자꾸 가두려 하는 걸까요? 30년전 노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젊디젊은 노인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젊은이 한 명이 4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라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의 노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럼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인의 연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속속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고, 자아 정체성이 강한 새로운 집단입니다. 꼭 그들을 고령자로 분류하며 사회의 짐으로 인식해야 할까요?
노인은 절대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본인이 노인이 되고서야 깨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인이 아니야”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노년에 접어들면 그 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이 고령사회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표준 철도궤도는 1m52cm랍니다. 어디에서 나온 기준일까요? 로마시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의 폭이 1m52cm였답니다. 갖가지 관행과 습관이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고출산사회의 해법으로 답을 찾는 오류는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도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첫 삽을 뜨는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젊은 날입니다.
리봄 디자이너 조연미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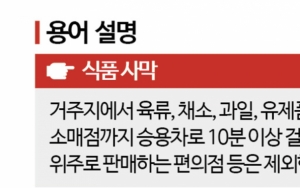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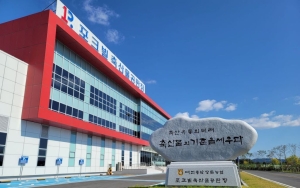














![[단독]잡기는커녕 문재인 때보다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 '역대 최고'[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121110490952119_176541774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