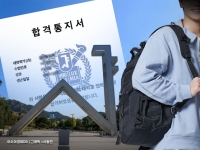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압도…불평등한 기득권이 불평등 더 가속화시켜
토마 피케티가 또다시 조명받고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이 '피케티의 대항마'로 잘못 알려지면서 '피케티 vs 디턴'의 구도가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부터다. 디턴과 피케티 모두 불평등 확대의 요인을 성장률 저하로 지목하고 있는 등 두 학자는 대척점에 서 있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앵거스 디턴의 이론과 함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갖는 의미를 다시한번 톺아본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단순하지만 잔인한 부등식 r>g(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돈다)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세계적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는 지난 해 6월 강연자로 나선 토마 피케티(44)를 이렇게 소개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주장하는 바도 명쾌하다.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웃돈다'(r>g).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전체 경제 성장률을 압도한다는 뜻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뜨끔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자신들의 주장의 아킬레스 건을 건들었기 때문이다. 책 출간 후 피게티는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는 이를 '피케티 패닉(Piketty Panic)'으로 함축했다.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류 경제자들은 반격에 나섰다.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숫자와 사실과 이론을 선망해야 할 경제학자에게 '추측'은 격한 비하의 의미다. 하비에르 살라이마틴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초부유층의 인물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습자본 주의를 말하기 어렵다"며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피케티 논쟁'을 이어갔다.
◆r>g 격차 심해지면 세습자본주의 심화…시장과 불평등을 바라본 피케티의 관점
"서른 살에는 연봉 1200프랑을 받는 법관이 되겠지. 마흔살이 되면 지참금을 6000리브로 정도 들고 오는 방앗간 집 딸과 결혼할 테고. 감지덕지할 일이지. 자네가 원한다면 약간의 더러운 정치적 수단으로 마흔이 되기 전에 검사장이 될 수도 있을거야. 하지만 프랑스에 검사장은 고작 스무명 뿐인데, 그 자리를 노리는 자가 2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중략) 하지만 빅토린양과 결혼하면 당장 100만프랑을 손에 쥐고 스무살에 5만프랑의 이자소득(자본의 5%)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소설(289~290쪽) '고리오 영감(발자크, 1835년)'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세습 자본주의의 병폐를 꼬집었다. 소설은 상속을 받아 '금수저'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그리하여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사회를 우울하게 담았다. 피케티가 소설을 인용한 의도는 분명하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였던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와 미국의 '도금 시대'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저 우울했던 불평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피케티의 진단이었다.
피케티는 인류 역사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말한다. 1700년대까지 긴 시간 동안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 2013년에서야 평균 경제성장률이 3.0%로 상승했다. 반면 자본수익률은 4~5%대를 유지했다. 앞으로도 자본수익률이 4~5%를 유지하고 경제성장률이 1~2%를 유지한다면 자본/소득 비율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것이며,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피케터는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자본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세습자본 주의는 더욱 확고해지고 불평등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심화될 것이다.'
◆"세습자본주의 확대되면 시장원리 작동 안해…자본세 거둬야" 피케티의 해결방안
세습자본 주의는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자본이 상속되면서 후세대는 자본을 물려 받아야만 경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고, 능력을 통해 시장의 승자를 가르는 자본주의 건강한 약속도 깨지기 때문이다. 부는 한곳에만 쏠리고 자산 가격은 뛴다.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 부를 미처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서 부는 그 자리에서 쌓이고 또 쌓인다.
피케티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금을 내세웠다. 세계 경제는 이미 장기적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g)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은 자본성장률(r)을 떨어뜨려야 한다. 자본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후 수익률을 낮춘다면 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잠시나마 평등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세금 때문이라고 피케티는 분석했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각국은 고소득에 높은 세금을 물렸고, 그 결과 자본축적의 속도가 늦춰지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화 요인을 억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불평등도 누진성을 가진 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과세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1차 세계대전 뒤 높은 소득세율을 도입해 자본수익률과 자본축적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했던 미국과 유럽처럼 각국이 세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세율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높은 세금을 피해 조세피난처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反)자본주의자ㆍ공산주의자 아니냐는 오해에 대한 반론
'격차사회'와 '양극화' 문제를 꼬집은 피케티의 주장은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다. 피케티를 '반(反)자본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오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피케티는 스스로를 '세계화를 주장하는 자본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어느 자리에선가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그는 "자본축적은 지지한다. 다만 그 부는 중산층에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시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가 소수계층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세계화를 믿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믿는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믿는다. 다만 과도한 부의 불평등은 부의 이동을 감소시키고 일부 계층에 권력이 집중되도록 해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피케티는 누구인가
1971년 프랑스 파리 인근의 클리시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뒤 22세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과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1993년부터 3년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95년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내재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자본의 귀환: 1700~2010년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부-소득 비율' '세계 최상위 소득계층 데이터베이스' 외 다수의 이론서와 논문을 썼다. 2013년에는 이론과 응용 연구 측면에서 유럽 경제 연구에 탁월한 기여를 한 45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위뢰 얀손 상을 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카페]피케티, 부자를 들여다보니 '부자惡'이 보였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102607504322611_1.jpg)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쿠팡 잡으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13년 만의 '변심'에 활짝 웃는 이곳[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42307522530624_1745362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