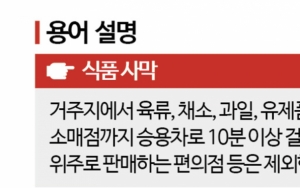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까지 '깜깜이'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북정보 무능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 핵실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험 직후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외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는 핵실험 15분 만인 오전 10시 45분께 유럽지중해지진센터가 "북한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8분 뒤에는 중국지진네트워크센터가 "북한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폭발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미국지질조사국은 "북한의 지진 발생지는 양강도 백암군"이라고 발표하는 등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규모 5 안팎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와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군과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그야말로 먹통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파라과이 국방장관회담을 준비중이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3년전 3차 실험을 앞두고는 수개월 전부터 "북한은 언제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원세훈 당시 원장 국회 정보위 발언)면서 경계경보를 내렸지만 이번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과거 1∼3차 핵실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사전 징후를 보이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진행된 1∼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외무성이나 국방위성명을 통해 사실상 핵실험 실시를 예고했으며, 핵실험 직전에 미국과 중국 등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핵무기 운반과 조립, 각종 계측장비 설치와 같은 사전 준비나 갱도 입구 봉쇄조치 등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다.
군안팎에서는 지난달 5일 한미 원자력 협정 발효 당시 북한의 반응, 지난달1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탄 개발 발언,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의 핵 병진 노선 관련 발언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핵실험의 징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北 수소탄실험]군당국 ‘대북정보 깜깜이’였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6010709284494299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