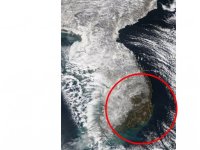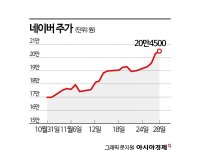배구는 세터, 야구는 투수가 '고수', 농구인 큰 키는 오히려 '핸디캡'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배구의 세터와 야구의 투수."
스포츠스타들은 골프도 잘 친다. 워낙 몸이 좋은데다가 종목은 다르지만 남다른 운동 신경이 있어서다. 당연히 습득 속도가 빠르다. 강한 정신력과 고도의 집중력, 위기관리능력까지 곁들여 실전에서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골프를 잘 치는 특정 포지션이 있을까. 배구에서는 세터, 야구는 투수들이 골프를 잘 친다고 정평이 나 있다.
▲ "손 감각이 좋아서"= 이경석 전 경기대 감독(54)과 김호철 전 현대캐피탈 감독(60), 신영철 한국전력 감독(51), 신치용 삼성화재 단장(60) 등 배구인 '골프 고수'의 포지션은 모두 세터다. 배구계의 '골프 넘버 1'으로 꼽히는 이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여주 이포골프장(파72)에서 열린 배구인골프대회에서 3언더파 69타의 스코어를 작성해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세터는 손 감각과 거리감이 뛰어나다. 어프로치 샷과 퍼팅 등 특히 쇼트게임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내는 이유다. 세터들이 정교함으로 승부한다면 호쾌한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공격수들은 반면 비거리가 강점이다. 현역 시절 왼손 거포였던 장윤창 경기대 교수(55)와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41)은 평균 300야드 이상의 장타를 날려 '짐승'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 "타자보다 투수가 유리하다고?"= 야구는 타자들이 골프를 잘 칠 것 같다. 스윙 매커니즘이 비슷하다는 편견 때문이다. 하지만 스윙 궤도가 다르다. 야구는 옆으로 휘두르는 레벨스윙인 반면 골프는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는 어퍼스윙이다. 물론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한다. 이종범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2013년 야구인골프대회에서 310야드를 날려 롱기스트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확도가 '꽝'이다. 강한 스윙은 악성 훅을 유발시킨다.
오히려 투수들이 잘 친다. 양상문 LG 감독(54)과 선동열 전 KIA 감독(52), 송진우 KBSN 해설위원(49) 등 '고수'들은 모두 투수 출신이다. 스윙이 끝날 때까지 100% 파워를 유지하는 타자들과 달리 힘을 빼면서 릴리스 하는 동작이 골프에서 탁월한 샷 감각으로 이어진다. 특급 좌완투수였던 윤석환 선린인터넷고 감독(54)은 "(투수들은) 체중 이동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다"며 "투수의 스로잉과 골프의 릴리스가 관련이 크다"고 분석했다.
▲ "키가 너무 커서"= 농구인들도 만만치 않다. 최인선 전 서울 SK 감독(65)과 김동광 전 서울 삼성 감독(62), 임달식 전 신한은행 감독(51), 이상민 서울 삼성 감독(43) 등이 농구계를 대표하는 로우핸디캐퍼들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신장이 크면 스윙 아크가 커서 유리하지만 농구선수들은 키가 커도 너무 커서 불리할 수 있다.
축구는 어떨까. 조광래 대구 FC 대표(61),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56), 김기동 올림픽대표팀 코치(44) 등이 골프를 즐기지만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는 골프에 대한 관심이 덜한 편이다. 아무래도 손이 아닌 발을 쓰는 종목이라서다. 축구인들은 공을 찰 때 왼쪽 다리를 고정시킨다는 대목이 골프의 중심이동과 비슷하다고 강조하지만 배구인과 야구인에 비해 평균 실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