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훈 칼럼]박희태 그리고 최시중, 이상득](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041811121709433_1.jpg)
[아시아경제 박명훈 주필]겨울바람 속에서 피어난 동백꽃은 절정의 날에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진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지는 붉은 동백꽃은 처연하기까지 하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슴을 울리는 시가 때로는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한다. '낙화'의 첫 구절이 정홍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장의 입에 올랐을 때, 그것은 다선 중진의원을 겨냥한 칼끝이었다. 그 칼에 스러질 꽃잎은 몇이나 될까.
떨어지는 꽃에서 문득 박희태 국회의장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비슷한 길을 가는 또 다른 두 사람도 생각났다. 모두 아름답게 떠날 기회가 있었다. 나이는 고희를 넘겼고 영화는 누릴 만큼 누렸다. 그러나 손에 쥔 한 움큼 권력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다. 때를 놓친 꽃은 시들어 불행해졌다. 이명박(MB)정권 탄생의 공신이자 실력자였던 박희태, 최시중, 이상득 세 사람이다.
박희태는 어제 새파란 검찰 후배로부터 추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에게는 4년 전 동백꽃처럼 떠날 기회가 있었다.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다. 정치 입문을 하면서 그는 입에 발린 말 대신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솔직 화법을 써 화제가 됐었다. 그런 그가 왜 '그만두라니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공천 탈락자가 집권여당 대표가 되는 황당한 사태도,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재보선에 나서는 무리수도, 현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오점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일어서 공천 탈락에 복수하는 듯했지만 '돈봉투'의 제물로 정치인생을 마감했다.
최시중은 MB정권 탄생의 공신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또는 최측근으로 불렸다. 비전문가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대통령은 그를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종편 특혜, 방송 장악의 논란에도 '방통대군' 소리를 들으며 힘을 과시했다. 그 여세를 몰아 지난해 3월 방통위원장 자리를 연임했다.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측근 보좌관의 비리 의혹과 돈봉투 파문으로 하차했다. 그 역시 때를 놓쳤다. 초대 방통위원장을 마쳤을 때 동백꽃이 되고자 해야 했다. 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이고 권좌에 다시 눌러앉았을 때 이미 아름다운 꽃은 아니었다.
이상득은 세상이 다 아는 대통령의 형이다. 그러나 혈연관계를 넘어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이자 정치적 멘토였다. 그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오랜 정치인생을 접는다. 보좌관 구속에서 자신의 돈 문제까지 불거지자 벼랑 끝에서 선택한 결과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궁금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국회의원을 또 하려고 하는가. 출마 포기 요구가 거셀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잘하니까 오래 있지!"
그럴까. 그를 둘러싸고 떠돈 말은 '영포회' '형님 뜻대로' '만사형통' 'MB병풍'에서 '형님예산'에 이르기까지 냉소적 표현뿐이다. 현안 정치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존재만으로 주목 받는 권력의 핵이었다. 돌아보면 그의 절정은 동생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였다. 그때 왜 후드득 떨어져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았을까. 힘없는 보통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동백꽃이 지면 찬란한 봄이다. 정치권은 벌써 봄빛이 완연하다. 자천타천 정치 지망생이 몰려든다. 흙탕물 정치판에, 정치인은 손가락질 받지만 정치하겠다는 사람은 넘쳐난다. 기이한 현상이다.
그들은 나라를 말하고, 국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한다. 욕망을 은폐한 정치꾼의 거창한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새 정치, 두 가지면 족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돈봉투 멀리 할 것. 하나 더 보탠다면, 떠날 때를 아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싶다.
박명훈 주필 pmho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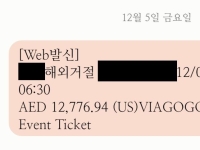






![[내일날씨]전국, 포근한 겨울날씨…서울 낮 최고 12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120619515445993_17650183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