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놓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에서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맞교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14일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과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설 예정이나 워낙 이견차이가 커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돌려쓰기' 추진=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726개 사업장에서 4138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5개 사업장 155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전체규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지방청 근로감독관만으로 50만개가 넘는 5인이상 사업장을 다 조사하기 불가능한 것은 물론, 중소기업 현항은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직 인원은 더 많은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손 댈 수 있는 공기업의 실직자부터 우선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슷한 업종의 회사끼리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명 '스와핑(swapping)'으로도 불리는 이 방법은 비정규직 고용기간(2년)이 끝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시 실직상태를 막기 위해 타 기관의 비정규직자와 맞바꿔 채용하는 것으로 민간부분에서는 이미 이러한 돌려쓰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계약해지 근로자 구제 방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기업들끼리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유사한 업종의 업체끼리 사용기간이 도래한 기간제근로자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교환하는 방법은 회사 입장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부담 없이 숙련된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정규직법 위반으로도 보기 힘들다. 물론, 정규직 전환 기회는 더 줄어들 위험이 있지만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자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 노조는 한국도로공자 노조는 이같은 '스와핑'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법' 오해와 진실 =비정규직법 시행 2주일째,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비정규직 근로자의 억울한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날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 후에 통보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관계를 미리 종료시켜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부당해고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내보낼 경우는 100%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장에서 2년 기간 도래 후 기간제근로자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후에도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정규직을 의미하지만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할 뿐, 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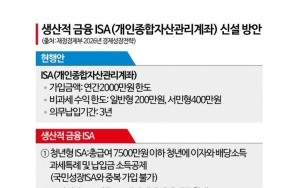



!["아내는 연상…원더우먼 같았다" 유산·가난 속에서 함께 버틴 박홍근 의원 '인생 최고의 반석' [배우자 열전]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0811050883808_1767837908.jpg)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예뻐보이더라" 정원오, 배우자 문혜정 첫 인상[배우자 열전]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0808171783102_17678278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