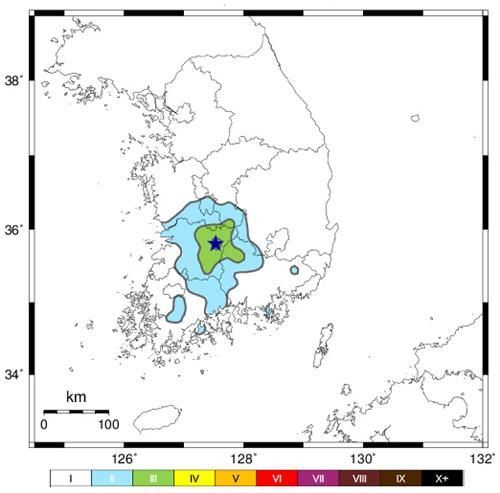느긋하게 차 마시며, 책 한권 음미
'20·30, 50·60' 한 자리에…동네 주민과 독서토론
북매니저가 책 설명 '쏠쏠한 재미'
"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자주 찾아요."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만난 김연아(27) 씨는 최근 동네에 있는 서점에 관심이 생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책을 소개해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책 추천도 받을 수 있어 그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청년 최태연 씨는 "(친구들과) 동네 책방을 가끔 찾는다. 사회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책방에서는 '쉼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서울 혜화동 한 주택 골목길에 있는 동네책방. 사진=한승곤 기자이른바 동네책방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30대 MZ세대는 물론 50~60대도 즐겨 찾는다고 한다. 단순히 책만 구입하는 게 아닌, 독서토론 등 각종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책방을 찾은 사람들끼리 소소한 담소를 나눌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한다. 한 공간에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동네책방이 인기가 많다 보니, 아예 책방에 대한 정보와 장소를 제공하는 '동네서점'이라는 웹사이트도 등장했다. 서점의 위치는 물론 특징 등을 정리해 제공한다. 동네책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한 혜화동에도 책방은 예닐곱개가 있다. 혜화로6길에 접어들면 흔히 볼 수 있는 주택가 골목이 이어지는데, 그곳에는 'OO책담'이라는 이름의 책방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만난 주인 이재호(54) 씨는 "책방은 올해로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찾고,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주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책방이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 동네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덧붙였다.
이인경 북매니저는 "책방이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우산을 맡기고 가는 동네 주민도 있고, 근처에 어르신이 많이 살다보니, 주인이 직접 택시를 잡아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탁물을 맡기고 갈 때 있고, 그런 걸 이 책방에서 함께 하고 있다(웃음)"고 말했다.
동네책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큐레이션. 책방 주인에게 책 추천을 받을수 있고, 책에 관해 다양한 질문도 할 수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실제로 동네책방을 찾는 이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최근 한 책방 토론 모임에 나갔다고 밝힌 30대 김모씨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일단 마음이 편했다.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매니저 등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어, 작가나 모르는 것에 대해 편하게 질문할 수 있어 좋다"고 강조했다.
결국 동네책방은 책 판매를 넘어, 책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독서토론 등 다양한 모임도 있어,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자리 역할도 한다.
그래서일까,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네서점'에 따르면 전국 동네책방은 2017년 283곳에서 2022년 815곳으로 늘었다. 동네책방 특징으로는 '커피·차가 있는 책방'이 237곳(2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립출판물 책방(21.0%), 큐레이션(15.6%) 등이 뒤를 이었다. 독서모임, 독서토론, 등 행사를 여는 곳도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일종의 '문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동양서림 내부. 사진=한승곤 기자동네책방에 이어 독립서점도 최근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점 주인에게 책을 추천받을 수 있고, 책 내용에 대해 살짝 귀띔도 들을 수 있어, 책 평론을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혜화동에 있는 '동양서림'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1953년, 혜화동 로터리에 고 이병도 국사학자 딸이자 고 장욱진 화백 부인이 처음 이곳에 서점을 열었다. 현재 '동양서림'은 2대 주인장을 거쳐 3대 주인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청년들은 '인터넷 세대'라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망도 굉장히 크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런 동네책방은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할 수 있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일종의 '살롱 문화'처럼 확산하기도 한다. 결국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그것을 또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