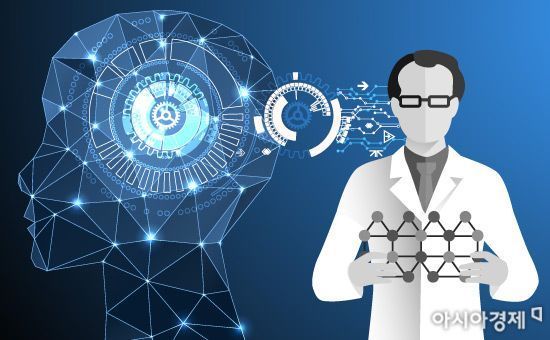뉴욕에서 미국 일상 속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뉴욕시가 이르면 내년 봄부터 맨해튼 도심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대대적으로 앞세운 명목은 '자동차 이용을 억제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맨해튼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지친 이들이라면 반길만한 목표다. 다만 보다 현실적인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이와 같다. "또 하나의 세금이 추가됐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지난주 미 연방도로청(FHA)이 혼잡통행료를 도입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을 승인하자 현지에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쏟아졌다. 혼잡통행료는 핵심 상업지구인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밑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최대 23달러(약 3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먼저 반응한 이들은 매일 차를 몰고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인근 뉴저지 및 코네티컷주 주민들이다. 이미 맨해튼 진입을 위해 17달러 가량의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지불 중인 상황에서 추가 경제적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혼잡통행료 승인 직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욕시의 돈 강탈(money grab)"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뉴요커들 사이에서도 혼잡통행료 도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찬성하는 이들은 혼잡통행료 효과를 톡톡히 본 영국 런던 등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런던은 2003년 혼잡통행료 도입 후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다.
최근 한국에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통행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처럼 인프라, 환경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다. 뉴욕시의 혼잡통행세를 지지한다고 밝힌 허벤씨는 "맨해튼의 최근 교통은 미친 수준 그 이상"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혼잡통행료를 통해 확보한 연간 10억달러를 지하철 시스템 정비,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는 런던, 스톡홀름 등 이미 혼잡통행료가 자리 잡은 도시들과 뉴욕시의 지리적 입지, 여건 등이 다르다는 분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뉴욕시의 의도와 달리, 맨해튼을 거치는 대신 뉴욕 브롱크스, 퀸스로 돌아가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난이 심화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혼잡통행료 지불을 꺼리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대되며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팬데믹 이후 공실 문제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불가피해 보인다. 도심 상업지구에 위치한 상가에 각종 물품을 배달하는 차들도, 택시·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도 필수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쏟아진다. 맨해튼 첼시 지역에 거주하는 오브리씨는 "모든 것이 비싸질 것이다. 운전하지 않아도,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혼잡통행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이는 결국 소비자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에서 혼잡통행료 도입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2007년이다. 영국 런던에서 켄 리빙스턴 당시 시장의 혼잡통행료 도입 카드가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재선으로 이어진 직후였다. 이후 지역 논의를 거쳐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기까지 무려 10년이상이 걸렸다. 오랜 기간 런던의 성공사례를 부러워해온 뉴욕시가 이제 악명높은 교통체증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다만 과거 혼잡교통료를 도입한 도시들이 모두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본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