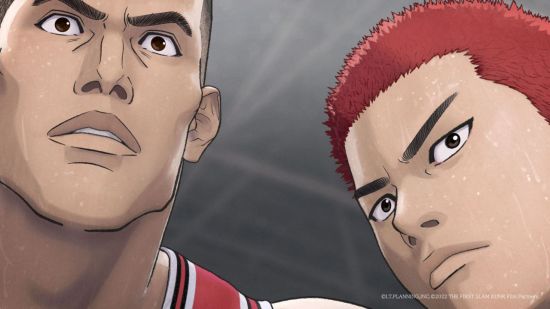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기세 심상치 않아
동력은 3040 세대…향수 자극하는 촉매제로
경제위기 겪으며 문화적 감수성 스스로 억제해와
위로로 새 가능성 제시 "영광의 순간은 지금"
"추억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 자,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살립니다." 이윽고 흘러나오는 반주.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오프닝 곡 '너에게로 가는 길'이다. 가수 박상민의 노래가 덧입혀지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일었다. 아스라이 떠오르는 추억에 교착되는 감회와 슬픔, 반가움의 표현이었다. 지난 12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2관에서 열린 '박상민과 함께하는 크레이지 포 유 상영회' 풍경이다. 지난날을 추상하려는 3040 세대로 좌석 432석이 2시간 만에 매진됐다. 배급사 NEW의 김민지 홍보팀장은 "예매 오픈 시간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입장권이 조기에 매진됐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자발적인 '싱어롱(관객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문화)'으로 전개됐다. 박상민이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기도 전에 떼창이 시작됐다.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박차 올라 외치고 싶어. 크레이지 포유, 크레이지 포 유. 슬램덩크!"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부터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린다. 15일까지 누적 관객 수는 93만4846명. 100만 명 돌파는 따 놓은 당상이다. 결코 얕잡아 볼 기준이 아니다. 상회한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여섯 편에 불과하다. '너의 이름은(2017·367만3885명)'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301만5165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2·약 200만 명 추정)',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2021·215만1861명)' '벼랑 위의 포뇨(2008·152만1842명)', '마루 밑 아리에티(2010·108만3746명)' 등이다. 박스오피스 1위 등극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난 주말(13~15일) 동원한 관객 수는 34만5170명. 1위 '아바타: 물의 길(39만2185명)'을 4만7015명 차로 따라붙었다. 개봉 첫 주말(6~8일) 격차는 28만2674명이었다.
상승세의 동력은 단연 3040 세대. CGV 조사에 따르면 지난 4~12일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관람한 30대와 40대 관객 비율은 각각 43.2%와 34.7%다. 이례적으로 남성 비중(61.9%)이 여성보다 컸다. 개봉 전부터 예상돼온 수요다. 학창 시절인 1990년대에 '슬램덩크'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을 경험했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특히 대원 '소년 챔프'에 실린 만화는 서울문화사 '아이큐 점프'가 앞세운 '드래곤볼'과 함께 만화잡지 시장에서 쌍두마차를 이뤘다. 원작 만화도 지금껏 1450만 부 이상 팔렸다. 철학자 민이언은 저서 '그로부터 20년 후'에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 또래들의 학창 시절엔 그야말로 농구 열풍이었다. 체육 선생님이 공만 던져주면 알아서 놀았던 시절의 교육과정에선, 농구 골대를 차지하지 못한 녀석들이 축구를 했을 정도이다. 전교 1등과 전교 꼴찌가 따가운 햇볕 아래 미끄덩거리는 살을 맞대고 어울리던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다. 나이키는 에어 조던 시리즈 하나로 아디다스와 리복을 저만치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었다. 뻔히 가지 못할 대학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연고전에는 어찌나 환호를 쏟아냈던지…. 매주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슬램덩크'가 연재되던 주간 만화잡지의 발행일에는, 반의 아이들이 야자(야간자율학습) 시간을 기다렸다. 그날이면 열혈 독자였던 친구 한 놈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학교 근처의 서점에서 이번 주의 이야기를 사 들고 왔기 때문이다."
주머니를 털어 만화를 모으던 3040 남성들에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향수를 자극하는 촉매제와 같다. 모를 리 없는 국내 배급사들은 눈치 싸움을 벌였으나 경쟁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한국 판권을 확보한 에스엠지홀딩스에서 NEW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엉덩이 탐정' 시리즈, '원피스 필름레드(2022)' 등을 함께하며 상호 간에 쌓인 신뢰를 우선시했다. NEW는 개봉일에 스크린 809개(2096회 상영)를 확보하며 보답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는 신카이 마코토·미야자키 하야오 등 유명 감독들의 작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50개 정도를 가져간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서너 배 확대된 규모를 너끈히 소화한다. 지난 주말 좌석 판매율 23.5%를 기록했다. 1만석 이상을 갖춘 영화 가운데 가장 높았다.
황재현 CGV 전략지원 담당은 "3040 세대에서 쏟아내는 관심이 1020 세대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가족 관객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류상헌 NEW 유통전략팀장은 "구매력은 있지만, 극장을 찾지 않던 3040 세대 남성을 극장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장기 흥행의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적 위축이다. 취업난 등 경제 위기를 겪으며 청소년기에 축적된 문화적 감수성을 스스로 억제해야 했다.
1970ㆍ1980년대생들은 고도성장의 혜택을 받은 마지막 세대다. 여느 시대의 아이들보다 물질적으로 혜택받았다. TV, 에어컨, 자기 방 등 청소년 전용 아이템이 보급되는 과도기를 직접 체험했다. '슬램덩크'를 위시한 일본문화 개방도 그중 하나였다. 가혹한 입시전쟁 속에서 머리를 식힐 청량한 바람이 돼줬다. 당시 학생들은 공부해서 출세하자는 꿈을 부모와 함께 좇았다. 입시 공부의 괴로움과 부모의 기대라는 압박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고도성장 노선을 전제로 한 가치관이 내면화된 결과였다. 입시만 뚫으면 세련화해 가는 소비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비껴간 우연은 실망에 그치지만, 필연이라 믿었던 것들은 비껴가면 절망이 된다. 3040 세대의 현실은 후자다. 집 한 채를 구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퍽퍽하다. 체력은 계속 약해지고, 부모의 퇴직으로 책임감은 커졌다. 좌절감만 쌓인 채 불혹을 넘기거나 앞뒀다. '취직 빙하기'를 겪으며 고독감도 커졌다. 적잖은 이들이 혼자 지내고, 친밀했던 사람들과 멀어졌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익힌 가치관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낙망에 감춰진 과거의 감수성을 강하게 소환한다. 북산고 농구부의 꿈과 열정, 도전을 조명하는 이야기다. 모두가 약체라고 무시한 설움을 딛고 감동적인 승리를 이뤄낸다. 중심에는 만화에서 주목받지 못한 송태섭이 자리한다. 일찍이 코트에서 두각을 보인 형 송준섭의 영향으로 드리블과 슛을 연습한다. 형이 사실상 죽고 농구는 스트레스로 변한다. 코트 안팎에서 관계자들이 형제의 실력을 계속해서 비교한다. 어머니도 농구에 열중하는 송태섭에게서 장남의 그림자를 느껴 거리를 둔다.
송태섭이 맡은 포인트가드는 태생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자리다. 드리블, 상대 팀 수비 등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동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들이 어디에 가 있게 될지까지 집중해야 한다. 공을 잡은 뒤에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늦는다. 누가 곧 공간으로 뛰어들게 될지, 누가 백도어 컷을 할지 등을 훤히 내다봐야 한다. 비전, 즉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주눅이 든 선수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안 되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 실수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다.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도 승부처에서 공을 빼앗겨봤다. 불세출 가드들 또한 어시스트보다 실책을 더 많이 기록할 때가 있다.
송태섭은 실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고치고 연습한다. 그 덕에 남부럽지 않은 드리블 기술을 익힌다. 상대의 촘촘한 더블팀을 보란 듯 빠져나와 득점을 유도한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순간이다.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쏟으며 열정을 불태웠다. 시간이란 먼지에 뒤덮여 까맣게 잊었을 뿐이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소중한 기억을 상기시키며 기죽은 3040 세대를 위로한다. "영광의 순간은 지금"이라며 또 다른 가능성까지 가리킨다. 주제가인 '제ZERO감(第ゼロ感)' 가사대로다. "뜨거운 모래를 박차고 저항하는 거야, 약속 앞에서. 생명줄은 없는 거야, 서커스의 밤에. 아직 한창인 여행길, 속도를 낼 거야, 더욱더."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