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갈수록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부 공공기관들이 미성년자 성폭행ㆍ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가 가능한 징계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임직원들의 성범죄ㆍ음주운전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다. 공직유관단체란, 한국은행ㆍ공기업ㆍ지방공기업, 정부 업무 위탁ㆍ대행 기관 등을 말하며 1000여개에 달한다.
성범죄의 경우 2011년 9건에서 2012년 20건, 2013년 15건, 2014년 23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41건에 달했고, 지난해 10월 말까지 34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도 2011년 24건에서 2012년 394건, 2013년 166건으로 폭증했다. 2014년 121건, 2015년 83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지난해엔 10월 말 현재 37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성범죄의 유형은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156건 중 성희롱이 93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 38건(24.4%), 성매매 16건(10.2%), 성폭행 9건(5.8%)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성범죄ㆍ음주운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2010년 이후 일어난 156건 중 경징계 94건(60.2%)만 파면(41건ㆍ26.3%), 강등(5건ㆍ3.2%), 정직(48건ㆍ30.8%) 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경징계(43건ㆍ27.6%) 또는 아예 징계하지 않았다(19건ㆍ12.2%). 이와 관련 국가공무원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80건의 성범죄에 대해 100% 징계(경징계 39.2%ㆍ중징계 60.8%)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A기관 B차장은 계약직 여직원 C씨를 상대로 "계약을 연장해주겠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나 해당 기관은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 요구를 했고, 나중엔 포상을 이유로 감경해 '주의 촉구'로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았다. D기관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된 고위 관계자에 대해 경징계 요구한 후 포상을 이유로 징계를 감면해줬다. E기관도 부하 여직원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간부 F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단순 경고에 그쳤다.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다. 2010년 이후 적발된 1226건 중 727건(59.2%)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중징계는 50건(4.1%)에 불과했고, 나머지 449건(36.6%)는 경징계에 그쳤다. 실제 G기관 H차장은 아랍에미리트 파견 근무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도주했다가 체포하는 등 국제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견책' 경징계에 그쳤다. I기관도 이미 음주 운전이 적발돼 면허 정기가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J과장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징계 요구를 한 후 곧 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말했다. K기관은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처럼 공직유관단체들이 성범죄ㆍ음주 운전에 관대한 것은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아예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7개 기관 중 성범죄 징계 양정 기준이 없는 기관이 14개(20.9%)나 됐다. 이중 성매매 징계 기준이 없는 기관이 4개,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기준이 모두 없는 기관이 10개 등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는 기관도 23개(34.3%)나 됐다.
징계 기준이 있더라도 불명확하거나 징계 수준이 미흡해 '봐주기식' 처벌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 징계 기준을 제정한 53개 기관 중 15개 기관, 음주운전은 44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이에 해당됐다.
예컨대 한 공사는 성범죄ㆍ음주운전을 '폭행' 등과 묶어서 사생활 문란으로 규정해 근무지 이탈ㆍ근무시간 중 음주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해놨다. 다른 한 공사도 성범죄를 유형 구분없이 일괄 규정해 심지어 성폭행도 '주의' 조치에 그칠 수 있도록 해놨다. 또 다른 한 공사는 심지어 미성년자 성폭행도 '견책'이 가능했다.
자체적인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적발ㆍ정화 노력도 거의 없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비위 사실은 수사 기관들이 알아서 통보해주지 않아 자체 적발 노력이 중요하다. 범죄경력회보서나 운전경력증명서로 임직원들의 성범죄ㆍ음주운전 적발 여부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외부 기관에 의한 적발이 있기 전까지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덕분에 사후적으로 일괄 적발된 경우 징계 시효 경과로 대부분 징계없이 처리되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기관들에게 징계양정기준 신설 또는 보완,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 징계 감경 금지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해 공공부문 신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징계 기준을 마련ㆍ보완해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그후]공공기관 임직원은 미성년자 성폭행해도 '경징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8111007435801973A_1.jpg)
![[뉴스 그후]공공기관 임직원은 미성년자 성폭행해도 '경징계'?](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7062015453896346_1.jpg)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19/2026013014211022823_1769750471.png)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상속자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쿠팡 잡으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13년 만의 '변심'에 활짝 웃는 이곳[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5042307522530624_174536234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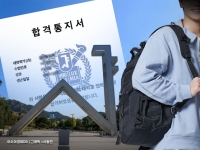
![[속보]정원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308/2026020515404130595_177027364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