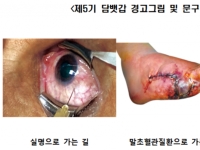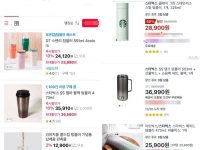1950년대 '도시 미관' 위해 도로 따라 형성
"몰랐다" "신기하다" 20·30세대 호기심
일명 '힙지로'라 불리며 MZ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중구 을지로는 레트로 감성의 맛집과 카페가 즐비하다.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야 만나볼 수 있는 커피숍이나, 아예 간판이 없는 식당도 많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 속 숨은 맛집, 예쁜 공간을 찾는 것은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놀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을지로에 있는 일부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없다. 분명 건물의 높이, 넓이가 모두 다르지만, 쌍둥이처럼 딱 붙어 있다. 이른바 '맞벽 건축물'이다. 맞벽 건축이란 도시미관 등을 위해 상업지역이나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에 합의한 경우, 2개 건축물의 외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지어진 건물을 말한다.
이런 건물은 일조권 제한, 민법이 규정하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건축하면, 인접 대지 이격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다세대주택을 맞벽 건축으로 개발하면 두 건축물의 이격거리 1m를 각각 배제해 최대 2m를 확보할 수 있다.
을지로3가 역 입구에는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고 물리는 맞벽 건물이 많다. 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최영아(25) 씨는 "평소 그냥 지나다녔는데, (맞벽 건축) 얘기를 듣고 보니, 건물들이 다 붙어 있고 신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박재영(28) 씨는 "건물이 높지 않아 잘 몰랐는데 틈새가 없다는 걸 지금 알았다"면서 "을지로만의 특색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을지로 일대에 이런 맞벽 건물이 많은 것일까. 을지로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직후인 1950~1960년대라고 한다. 당시에는 초가집, 판잣집 등이 많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서울 도심 간선도로변에 들어서는 건물들의 최저 층수를 제한해 도시 미화에 나섰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낮은 층수의 건물이지만, 목조건물만 많았던 과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을지로에 있는 건물들은 고층 빌딩 수준의 건물인 셈이다. 맞벽 건축에 따라 을지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변에는 비슷한 높이로 지은 건축물들이 다닥다닥 붙은 형태로 들어섰다. 이는 현실적인 도시미화 방안이었다. 도로 주변에 빈틈없이 빼곡하게 들어선 건물들은 전쟁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도심 내부를 가릴 수 있었고, 그 사이 도시 재생을 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고층화 수단으로서 최저층수 제한을 지속해서 채택하고, 1970년에 제정된 미관지구제도를 통해 최저층수 제한의 범위를 도심 간선도로변이라는 제한된 지역이 아닌, 서울 행정구역 전체에 적용했다. 물론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맞벽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맞벽 건축을 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 하고, 마감 재료는 반드시 불연재료여야 했다.
결국 1950~1960년대에 세워진 맞벽 건물은 전쟁 전후부터 이어져 온 간선도로변 고층화 정책의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1990년대 말에 미관지구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이 MZ세대에게는 신기한 볼거리라는 시각도 있다. 주말에 친구들과 을지로를 자주 찾는다는 김세현(27) 씨는 "허름하지만, 감성적인 건물과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와 놀러 온다"고 말했다. 맞벽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사이에 틈이 없어 신기하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