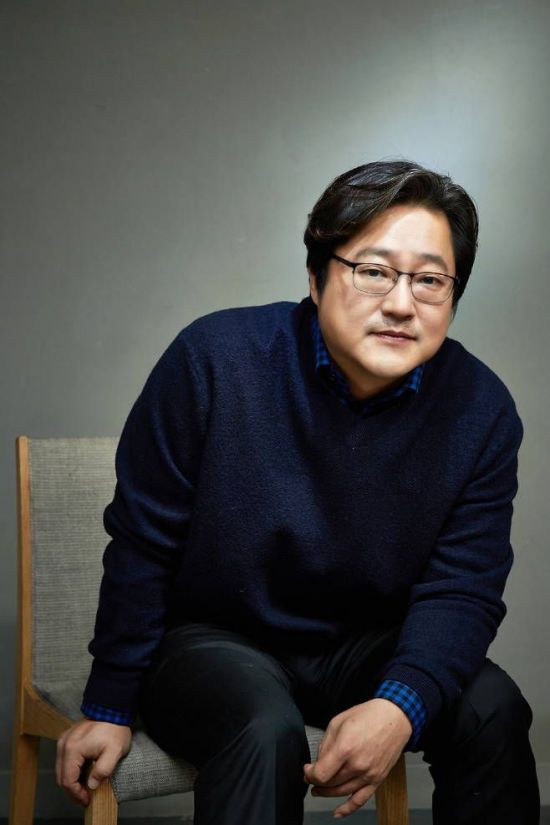곳곳에서 들리는 반도체 시장 하락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우울
반도체 사이클 회복, 예측 쉽지 않아
"사이클 주기 짧아져 전망 더 어려워"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전경 / 제공=삼성전자[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수요 부진 등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반도체 시장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시장 회복 시기를 두고선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사이클 등락을 반복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사이클 주기가 과거보다 빠르게 등락을 반복하는 점도 전망을 힘들게 하고 있다.
메모리 포함 시장 전망 어둡네…삼성전자·SK하이닉스 3Q 전망도 암울
2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 전망을 담은 각종 분석 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최근 2분기 반도체 시장이 1518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치상으로 감소치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업황 부진이 계속된다는 게 옴디아 설명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이미 올해와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이같은 전망에 동참한 바 있다. WSTS는 올해 6월 내놨던 전망치를 8월에 수정하면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6.3%에서 13.9%로, 내년 성장률은 5.1%에서 4.6%로 각각 낮췄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내년 성장률을 0.6%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0%대 성장을 예고했다.
메모리 반도체 주요 품목인 D램 가격 역시 하락세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2020년 하반기 시작돼 올해 5월까지 이어진 D램 시장 상승세가 끝났다며 내년 초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역시 4분기까지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든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어둡다. 통상 성수기로 불렸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세부 전망치는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12조~13조원대, SK하이닉스는 2조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5조8200억원, 4조17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전경 / 제공=SK하이닉스"미지수 두 개 부등식 풀 수 없다"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에선 인플레이션과 전방 수요 부진, 재고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반도체 시장은 통상 사이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는데, 이번엔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도체 업황이 언제 개선될지를 내다보는 전망도 속속 나오지만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지수인 수요(X)와 공급(Y)을 두고 또 다른 미지수(Z)를 구하고자 부등식을 푸는 것과 같다며 "원래 미지수가 두 개인 부등식은 풀 수가 없어 반도체 시장 예측이 번번이 틀린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사이클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점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해서 4년 주기로 사이클이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그 사이클이 1~2년 만에 업다운 하기도 해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황기인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밝히는 등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사이클 예측이 어려운 산업 특성에 기인했다는 평가다. 사이클 회복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소홀히 하면 막상 시장 경기가 회복됐을 때 제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독일 키몬다와 일본 엘피다 등 불황기 때 투자에 인색했던 반도체 기업이 결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선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은 "불황기에 투자를 적게 해놓으면 호황기 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시장 업 앤 다운(등락)에 의존하기보단 꾸준한 투자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