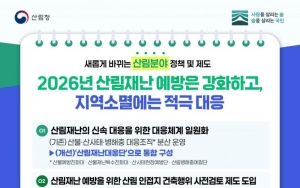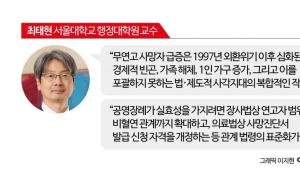달라진 경제·물가상승 등 반영 안돼
SVB 사태 이후 정치권 법안 발의
![[초동시각]20년 묵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해야](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33011314472553_1680143505.jpg)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공포가 되살아났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통해 금융회사의 파산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미국발 은행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유럽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전세계 은행 자산순위 45위인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에서 회계상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고 최대주주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이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며 위기설에 휩싸였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서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뱅크데믹(은행+팬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은행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합성어로, 은행리스크가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의미다.
은행리스크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으나 각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미국 정부는 SVB와 뒤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등에 예금보험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키로 하고 현재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미국 정부가 SVB 사태 해결을 위해 예금 전액 보증 등의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이나 금융자산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5000만원이다. 이같은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에 2000만원에서 올린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20년 넘게 유지돼 온 것이다. 그동안 달라진 경제 규모, 물가 상승, 예금 규모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독일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1억원)이다. 2021년 추정치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1.25배다. 미국은 3.6배, 일본·영국은 2.3배로 우리보다 높다. 2001년에 비해 1인당 GDP는 약 3배,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보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 규모는 약 5배 늘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넘는 국내 예금 규모는 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976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504조원까지 불어났다.
SVB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여야 모두에서 현행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예보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인상될 것이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다.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뜨는 뉴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을 수 없어서다. 은행에 맡긴 예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뱅크런을 야기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소비자에게 예금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논의해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