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학술지 공개 논문 21건…모두 공저자로 참여
靑 보좌관 물러난 직후에도 논문 게재…기여도 의혹
'황우석 사태' 때도 13번째 공저자 이름 올려 논란
과기정통부 "검색 안 되는 논문도…현재 파악 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연구윤리 논란이 일었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1992년 순천대 교수(생물학) 임용 이후 국내·외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단독·주저자로 저술한 게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 임용된 이후 박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연구해 저술한 논문은 없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보조적으로 참여해 이름을 올린 논문만 있다는 것이다.
10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국가과학기술 전자도서관(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등에 따르면 박 본부장이 순천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국내·외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일반에 공개한 논문은 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학계에서 인정받는 KCI 등재 논문은 '한국식물생명공학회지'와 '한국식물학회지' 등에 실린 14건으로 집계됐다. 해외논문은 플랜트저널(The Plant Journal) 등에 게재한 7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들을 보면 박 본부장은 자신의 제자 등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2014년 생명공학회지에 게재한 한 학술논문은 자신의 제자와 2명이 작성했고, 해외논문 중에선 3~7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순천대 교수로 재임한 지난 25년 동안 주저자로 저술한 논문은 없었다. 과학계에선 박 본부장이 전공한 자연과학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연구실적에 의문을 제기한다.
각 대학들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등재 여부와 저술에 참가한 사람 수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박 본부장이 재직 중인 순천대에서는 국내 등재학술지의 경우 평가에서 100점을 부여하지만, 학술회의 등에 낸 페이퍼에는 10점을 주기도 한다. 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논문을 썼을 땐 인정비율이 단독저술의 20%이다.
일부 논문은 박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게재돼 박 본부장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본부장이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Changes in Cellular Polyamine Contents and Activities of Their Biosynthetic Enzymes at Each Phase of the Cell Cycle in BY-2 Cells' 논문은 2006년 4월 식물학회지에 게재됐다. 박 본부장은 2006년 1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서 물러나 같은 해 2월 복직했다.
박 본부장은 2004년 1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낼 당시에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13번째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황우석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박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공저자로 이름이 들어간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박 본부장은 연구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논문의) 퍼스트 네임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논문에) 기여도가 없으면 (이름을) 다 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험이 많은 프로젝트는 논문에 이름을 다 실어주기도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넣는 꼼수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노무현 정부가 깔끔하게 처리를 안 했다"며 "박 본부장도 아무런 징계를 안 받고 바로 학교에 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본부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술지의 형태나 개인의 요청 등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지 않거나 검색이 안 되는 논문들이 있다"며 "정확한 논문 수와 대표·공동·교신저자 여부 등은 파악 중이어서 공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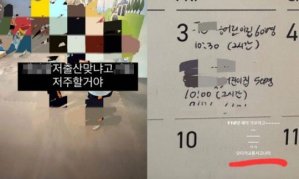

![[포토]BTS 데뷔 10주년 맞아 하이브 앞 찾은 외국인관광객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3061308571161328_1686614230.jpg)

![[포토] '발리댁' 가희, 탄탄한 복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76/2022101417545469305_166573769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