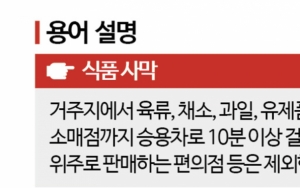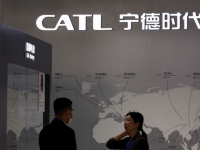교과부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문대성 당선자가 '논문표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 학계에 만연한 표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대는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표절 및 대필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학교 김 모씨의 박사학위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문 씨의 논문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예비조사위원회 이후 본조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구성돼 9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며 "결과에 따른 내용증명과 관련해 논문 작성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명 인사들이 논문 표절로 곤혹을 치른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 총리가 논문표절로 취임 13일 만에 사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도 평교수 시절 쓴 논문 5편이 표절로 판명돼 총장 취임 56일 만에 물러났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 숙명여대 출신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취임 2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표절 시비가 반복되는 것은 학계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사립대 한 교수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참고 수준이 아니라 '베끼기'에 가깝게 쓰고도 논문 심사를 통과한 사례도 종종 있다"며 "해외에서는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엄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부 심사위원의 판단에 맡길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표절 등의 문제를 전적으로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맡기고 있다. 이들 기관이 표절 시비가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 이후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표절, 변조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따라 표절 여부를 가려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연구소에 따라 기준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실정에 맞게 윤리 규정을 만들어 지키고, 이에 따른 체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사전에 표절 여부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논문 표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윤리 책임이며, 두 번째로는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각 대학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제보여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후조처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스템적으로도 교과부 차원의 훈령만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다"며 "처벌을 한다 해도 '소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