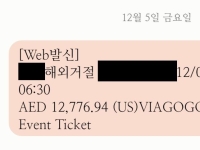[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이상미 기자] 가난한 대학생들의 교재비를 줄여주던 '책제본' 관행에 정부가 칼을 들이댔다. 명분은 '저작권 보호'다. 구체적인 단속의 기준은 '저작권이 있는 단행본의 내용 가운데 10% 이상을 복제'한 복사물이다. 단속의 대상은 의뢰인인 대학생이 아니라 제본을 맡은 복사업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3월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경찰ㆍ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제본물 228건(7430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대학의 교내ㆍ외 1239개 복사업소가 단속에 걸려들었다.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한 제본들을 전량 폐기하는 동시에 제본 규모가 비교적 컸던 복사업소 20곳의 업주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불법제본 단속을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펴낸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집계된 국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6914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출판물이 2996억여원이다.
불법 출판물의 거의 대부분은 대학가에서 유통되는 제본이며 이에 따른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규모는 무려 2364억여원에 이른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물을 불법 복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상을 짓는 것은 복사업소의 업주들만이 아니다. 간편하게 복사를 의뢰할 장소를 잃어버린 대학생들의 한숨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만난 서울 Y대학 경제학과 4학년 구효석(27ㆍ남, 가명)씨도 그런 경우다. 국제금융론ㆍ재정학ㆍ시사경제ㆍ금융정책의이해ㆍ조세론ㆍ금융연구ㆍ기업금융론. 그가 2011학년도 1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이다. 주교재는 모두 7권. 가장 싼 책이 2만3000원이고 가장 비싼 책은 3만8000원이다.
7권을 모두 구입하려면 18만원 가량이 들고, 부교재와 주요 참고서적까지 완벽히 구비하려면 대략 2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 학기 등록금(약 270만원)의 약 9%에 달하는 거금이다. 고향(경북 구미)을 떠나 자취를 하는 구씨의 한 달 생활비는 자취방 관련 공과금 등 '필수 생활비'를 빼면 35만원 가량. '정석'대로 책을 다 사면 10만원 밖에 안 남는다.
이런 구씨가 한 숨을 돌릴 수 있게된 건 다름아닌 '책 제본' 때문이었다. 담당 교수들이 학생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해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제본을 해주는 것이다. 교수가 조교를 통해 복사업체에 제본을 맡기면 학생들이 이를 찾아간다. 가격은 대부분 1권당 1만원 아래다.
구씨는 제본 덕에 이번 학기 책 값을 7만여원으로 줄였다. 제본이 불법이라는 건 구씨도, 교수들도 잘 안다. 그렇지만 치솟는 등록금 등 어마어마한 학비부담을 감안하면 대놓고 비난만 할 순 없는 실정이다. 구씨는 "제본을 못 한다면 학기초마다 집에 전화드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면서 "교재를 제값에 모두 구입하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구씨를 포함해 대학생 시절을 거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제본. 구씨는 "제본 단속이 심해 제본을 못해주겠다는 복사집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제본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데 당장 다음 학기를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등록금은 또 오를테고 물가도 덩달아 오를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같은 날 서울 K대학에서 만난 이 학교 물리학과 3학년 오지은(23ㆍ여)씨는 "불법인 걸 누가 모르겠냐"면서도 "우리 학과의 경우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하면 학비가 한 학기에 500만원 가까이 들어 제본마저 못하게 되면 생활고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힘들기는 복사업체 업주들도 마찬가지다. 단속이 계속 될 예정이라 무턱대고 제본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가 복사업체들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제본에 의존하고 있다. K대학 정문 건너편에 즐비하게 늘어선 복사업체 20여곳 가운데 한 곳인 H문화사 업주 유모(53)씨는 "저희 가게도 단속을 당해 제본 30권 정도를 압수당했다. 단속 이후 제본 주문을 거의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대로 하자면 문제가 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데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단속을 하면 업자들은 영업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본을 단속하는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다. 학생들과 복사업체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학 때 제본을 해 본 기억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작권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노력을 해서 만든 저작물이 함부로 복제되고 있다면 어떻겠느냐"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